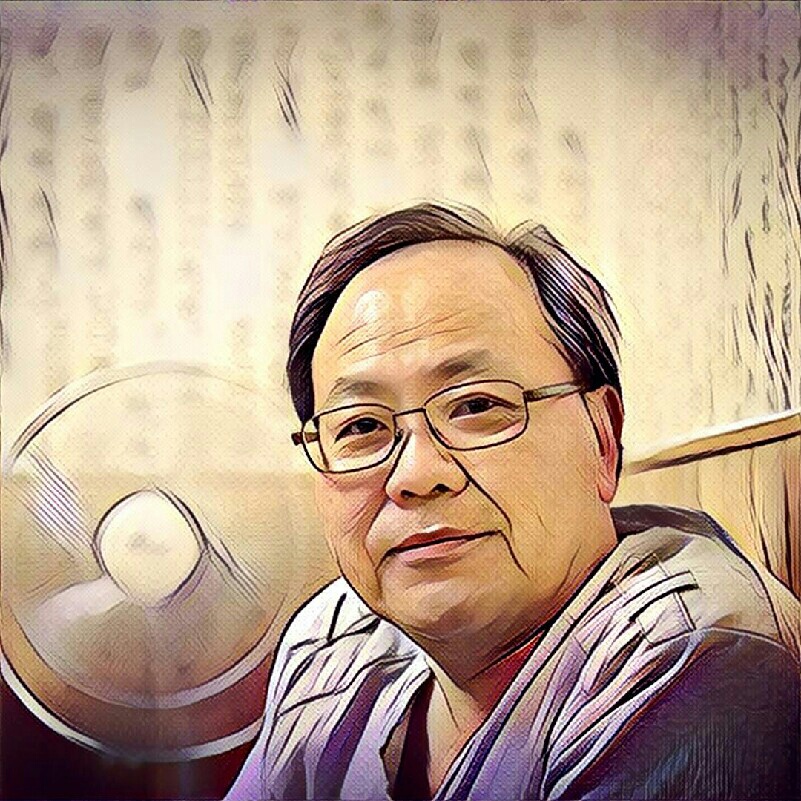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1mm 치과
- 碑巖寺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자이안트 강마담 010 5228 –7231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티스토리챌린지
- 이어령#눈물한방울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오블완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추억의도시
- 60bpm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황우창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익숙해질 때
- y.c.s.정모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자이언트에 남은 시간 본문
자이언트에 남은 시간
한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르던 단골 술집들이 이젠 어디 있는지조차 가물거릴 지경이다. 자이안트. 그 이름 석 자는 아직도 나를 붙잡는다. 이미 한참 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곳을 지나치는 골목 어귀에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게 된다. 아직도 그 간판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기억만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인지 모르겠다.
내가 기억하는 자이안트는 신포동 외환은행 뒤편, 가톨릭회관을 마주 보던 육교 밑 좁은 공간에서의 그 초라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 진한 사람 냄새를 풍기던 그곳.. 네댓 개의 테이블에 겨우 앉아 삐걱거리며 술잔을 나누던 젊은 날의 동료들과, 웃음과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자이안트의 전부였다.
그곳의 진짜 매력은 맥주 네 홉짜리 한 병에 소박한 안주 한 접시로도 충분했던 우리들의 우정이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입보다 눈빛이 더 말을 잘하던 시절이었다. 무엇보다도 강 마담은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옷 색깔을, 술병 숫자를, 안주의 종류까지 기억해냈다.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의 풍경이 되었고, 그 풍경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었다.
사람이 많지도, 공간이 넓지도 않았지만, 그 자그마한 자이안트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나눴다. 승진을 앞둔 기대와 걱정, 월급으로 산 선물 자랑, 실연 후에 눈물 젖은 고백까지.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숙연해지던 시간들이었다. 자이안트는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던 작은 무대였다.
그러나 무대는 늘 그대로일 수 없고, 배우들도 하나둘 퇴장한다. 누군가는 먼 타지로 떠나고, 누군가는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나도 어느새 신포동 골목에서 한참 떨어진 일상 속을 걷고 있었다.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 마담이었다. 이제는 학익동에서 7080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다. 함께 근무하던 홍 선생에게 내 연락처를 받았다면서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순간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그 목소리 너머로 그 시절의 웃음소리와 연기 자욱한 실내의 풍경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도 좋지 않고, 한 잔 술조차 조심해야 하는 몸이지만, 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마도, 나는 자이안트를 ‘그때 그 자리’에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 변한 자이안트의 모습이 그 소중한 추억을 덧칠해 버릴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편 마음 한구석엔, 그냥 조용히 얼굴 한번 보고 차 한잔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것마저 인연이라면,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마저도 망설이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다. 한걸음 다가서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자이안트는 내 젊은 날 속에만 있다. 거기서 웃고, 마시며 고뇌하던 우리들이 있다. 스무 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작은 테이블과, 정 많은 마담과, 형처럼 아우처럼 나눴던 사람들의 눈빛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슬슬 안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가끔 그리움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오지만, 그저 가슴속에서만 조용히 불러본다.
자이안트, 안녕.
젊은 날 나의 기억이여, 안녕... 2025.6.17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포동 거리에서 되살아난, 사라진 기억의 조각들 (0) | 2025.06.29 |
|---|---|
|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 (2) | 2025.06.25 |
| 그 시절의 놀이 (0) | 2025.04.21 |
| 아 미 월 (蛾眉月) (0) | 2025.02.04 |
| 노인이 되어 가는 중 (7)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