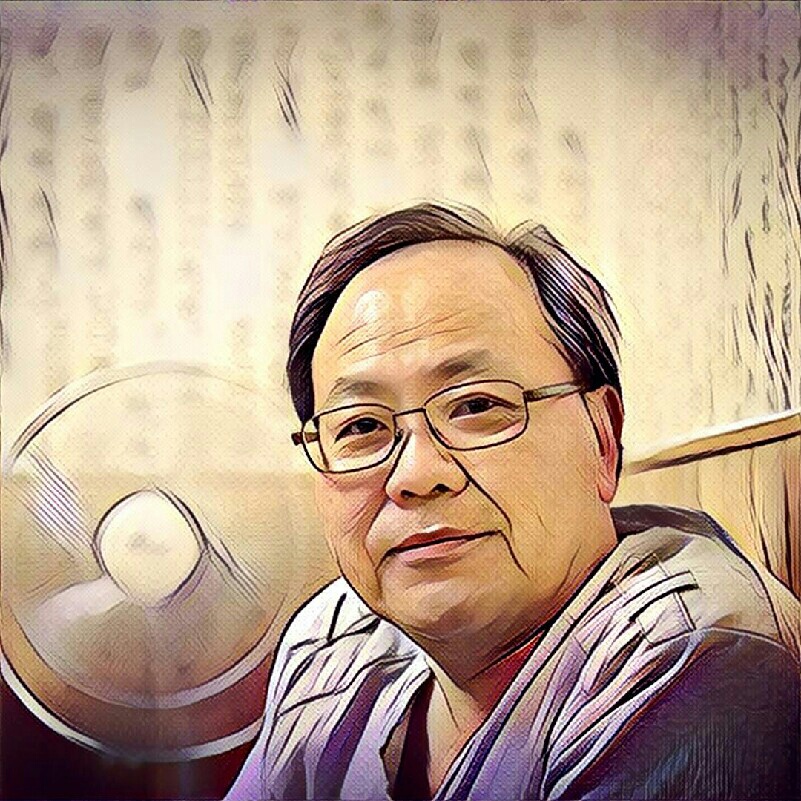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추억의도시
- 티스토리챌린지
- 황우창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자이안트 강마담 010 5228 –7231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젊은 날 그 기억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승룡
- 명욱.
- 오블완
- #스탠드바#대부스탠드바#인터내셔널스탠드바#An An#백악관#카페#Camus#조이너스#자이안트#흐르는것이어찌물뿐이랴#스테이션#탄트라#뽀야#대포집#이모집#고모집#큰우물집#신포순대#버드나무집#
- 광진이#광진#조광진#오윤석#윤석이#윤석#허석#석이
- 이어령#눈물한방울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호경형님.#영준형님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랩소디 인 블루#이인해글#한길아트
- 에디 히긴스 트리오#재즈 #피아노
- 세영이#하세영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하창용#민일식#여름방학#겨울방학#과외선생님#고모#광교공군풀장#시민의원#팔달산#푸른지대#중앙극장#미모사
- 하늘을 주제로 한 팝송#제목 몰라도 #들으면 아는 노래
- 익숙해질 때
- 碑巖寺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시환이#승원이#아다미순대국밥#탐앤탐스#두열이와통화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미모사로 시간의 결을 만지다 본문
미모사로 시간의 결을 만지다
일요일 오전, 문득 찾아온 후배와 배다리 삼강옥에서 설렁탕을 먹었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데우고 나니 마음까지 편안해졌다. 이어진 곳은 창영동의 ‘졸리 센티에르’라는 아담한 카페.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페 주인 김 선생이 테이블 위 작은 화분을 가리키며 넌지시 물었다. 이 작은 식물의 이름을 아느냐고. 잠시 머뭇거리는 내게, 그는 조용히 ‘미모사’라고 일러주었다.
‘아, 그 미모사.’ 단순한 이름 한마디였는데, 찰나의 순간, 잊었던 시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했다.
어느덧 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 기억 속 고모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수재들을 길러낸 명교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수원에서 서울 명문 중학교로 향하는 좁은 문, 그 문을 활짝 열어주던 이가 바로 나의 고모였다. 방학 때마다 나는 힘들게 합승버스를 타고 고모 댁으로 향하곤 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명문가 학부모들이 보내주던 간식, 낯설지만 달콤했던 바나나와 미제 쇼빵, 알록달록한 M&M 초콜릿 덕분에 그 길은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고모의 엄격하고도 열정적인 스파르타식 교육은 매달 내게 우등상을 안겨주었고, 그때 뗐던 천자문은 지금까지 내 삶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은 내 소년시절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다.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 중에 안경을 쓴 하얀 얼굴의 ‘일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시민의원 옆 화원, 거기서 일식이는 내게 미모사를 처음 보여주었다. 작은 손으로 톡 건드리자 잎을 오므리던 신기한 모습. 그 작은 미모사는 내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늘 졸리에서 만난 미모사는 그때보다 훨씬 작았지만, 김 선생이 씨앗으로 발아시켜 이제 막 자라는 중이라는 설명에 어쩐지 정겹게 느껴졌다.
작은 미모사 하나에 잊고 있던 일식이의 얼굴이 선명해지고, 멀리 미국에 계신 고모님의 모습이 불쑥 떠오르는 감각은 새삼스러웠다. 후배와 김 선생 모두 사진작가인데,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이야기한 ‘스투디움’(일식이와 미모사)과 ‘푼크툼’(고모와의 과외, 천자문)처럼 다가왔다. 어쩌면 사진은 과거를 박제하지만, 기억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기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자꾸만 어린 시절 수원의 그 골목으로, 그 화원으로, 그리고 따뜻한 고모 댁 마루로 조용히 걸어가는 듯했다. 잊고 지낸 줄 알았던 시간의 결들이 다시금 손끝에 잡히는 듯한, 담담하면서도 애틋한 순간이었다. 2025.8.10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골목사진, 오래된 마을의 기록'展을 준비하며 - 전시안내문 초안 (2) | 2025.08.18 |
|---|---|
| <골목 사진,오래된 마을의 기록> 기획 (5) | 2025.08.16 |
| 새우젓 골목의 노인 (3) | 2025.07.28 |
| 해외여행을 누구와 가고 싶은가? (1) | 2025.07.28 |
|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3) | 2025.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