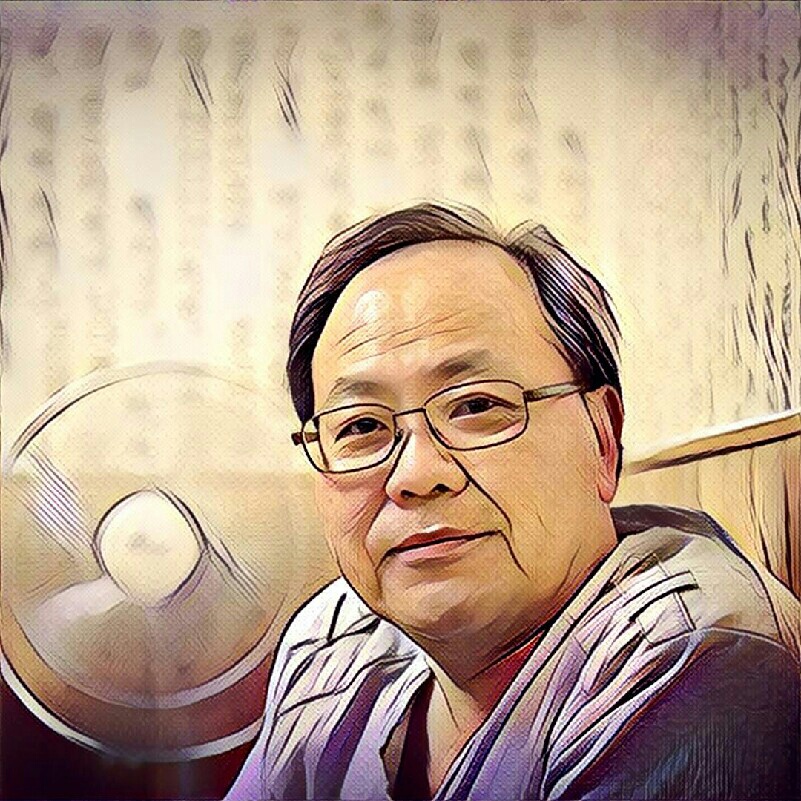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티스토리챌린지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y.c.s.정모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익숙해질 때
- 황우창
- 이어령#눈물한방울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자이안트 강마담 010 5228 –7231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1mm 치과
- 60bpm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오블완
- 碑巖寺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추억의도시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선술집 본문
선술집
김윤식 시인/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호일보 2016.05.13

▲ 김윤식 시인
"인천의 선술집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용동 ‘청대문’은 요즘의 ‘답동관’이나 ‘신포관’에 견줄 게 아니었다. 상투를 튼 안주과장이 산해진미를 모두 통솔했으며, 공평무사하게 손님이 묻는 대로 대답해 응했다. 얌전하고 상냥한 안주인이 손수 목로에 앉아서 그 많은 손님의 복잡한 셈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해내는 수완이 놀라웠다.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는 방법대로 해 줬다. 안주청에 쌓인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굽든지, 찌든지, 삶든지 자유요, 또 대환영이었다. 술잔과 그 수효에 따라 술값만 내면 그만이었다. 5전은 술과 안주를 포함한 값이다. 한 잔 마시고 안주 열 개를 먹어도 좋다. <중략> 술꾼 여러 패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석쇠 위에 올려 굽는 군침 도는 냄새와 기름 연기! 고추장, 왜간장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김과 그 냄새! 모두 구미가 동하는 명랑한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로 만나게 되니 인천인의 식도락과 사교장은 오직 이곳뿐이었다."
이 역시 고일(高逸)선생의 「인천석금」에 보이는 1920~30년대 인천의 선술집 이야기다.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으면 군침이 돌 법하다. 선술집은 일제의 강점 이후 서울·인천 등 대도시에 번창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로 만나게 되니", "식도락과 사교장은 오직 이곳뿐이었다"는 고일 선생의 말대로 식자층, 노동자 구별 없이 동락(同樂)하는 장소였다.
아무튼 선생의 글 속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안주과장’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그날 안주 일습을 관리하는 사람일 터인데, 당시에는 선술집들이 특별히 이 같은 안주 담당자를 뒀던 모양이다.
하긴 1927년 7월호 「별건곤」 잡지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온다. "선술집의 안주 감독이며 설렁탕집의 밥 뜨는 제군은…." 운운하는 구절이다. ‘과장’과 ‘감독’으로 칭호는 달라도 안주 담당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 정식 직함이라기보다는 그저 술꾼들이 그들을 높여 일컫던 말일 듯싶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선술집 운영 방식인데, 오늘날로 치면 영락없는 뷔페식이다. 안주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 ‘열 개를 먹어도 좋고’ 오직 ‘술잔 수효에 따라 값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안줏거리의 풍성함도 놀랍다. 선술집 하면 서민적이기는 하나 어딘가 허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때는 각종 육류와 어류를 고루 갖추고 찌개까지 끓였던 것이다. 이런 풍습을 가졌던 내동·용동·경동의 수많은 선술집들은 전쟁통에 모조리 사라지고 훗날 들어 지금과 같은 다소 야박한(?) 술집들이 생겨났다.
형태상 인천 최후의 선술집이라면 아마 신포동 시장 안에 있던 네댓 평짜리 ‘백항아리집’일 듯싶다. 주인 영감이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 되시는 할머니가 한동안 술청을 돌봤고, 뒤에는 출가한 딸까지 합세했다. 그러나 결국 1990년대 초반 무렵, 명물로 회자되던 이 집이 문을 닫아 인천 술꾼들의 발길을 몹시 허전하게 했다. 이 집이 정식 상호 없이 백항아리집으로 불린 것은 술청 한 구석에 큰 백자항아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백항아리집은 한국전쟁 후 신포시장 안에 문을 열었다. 워낙 힘든 때여서 별다른 안주 없이 시작했다고 한다. 좀 뒤에 값이 눅은 황세기 따위를 굽거나 손바닥만 한 양은그릇에 돼지뼈 감잣국 같은 것을 메뉴에 올렸다. 이 안주는 문을 닫을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주 고객도 처음에는 노점상이나 시장 안의 지게꾼, 수레꾼, 막노동꾼들이었다. 그러다 차츰 시청 공무원, 지역 신문기자, 체육인, 문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찾아오면서 계층이 다양해졌다.
윤갑로 전 인천시장도 이 집에 들른 적이 있다. 처음 발을 들여놓던 1960년대는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대부분이 그런 안주조차에도 눈을 주지 못하고 막소주나 막걸리 혹은 약주 한 양재기를 들이켜고는 목로에 놓인 양념도 하지 않은 짜디짠 날 새우젓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고일 선생 시절보다도 훨씬 못한 실로 초라하고 가난한 형색이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인천 명물 백항아리집에서 저녁마다 만나 뵙던 최병구, 손설향, 심창화 선생 같은 문인들, 후배 시인 채성병, 이효윤, 화가 우문국, 정순일 선생, 김영일, 홍윤표, 장주봉 화백, 서예가 부달선, 김인홍 선생,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윤용식 선생, 야구인 김 선생, 권투인 김병옥 선생 등등 한때 카바이드 불빛 아래 서서 위아래 없이 함께 잔을 기울이던 그 낭만의 시절이 못내 그립다.
'인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인천역 일대 신택리지 (0) | 2023.02.10 |
|---|---|
| 수인선 협궤열차 (0) | 2023.02.10 |
| 사라지는 인천 양키시장… 디오라마로 기록하다 (0) | 2023.02.10 |
| 단골손님이 판매할 책 선정 '특별한 동네 책방' 문학소매점 (0) | 2023.02.08 |
| 일제 가등정미소 파업 주동자 김응태를 발굴하다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