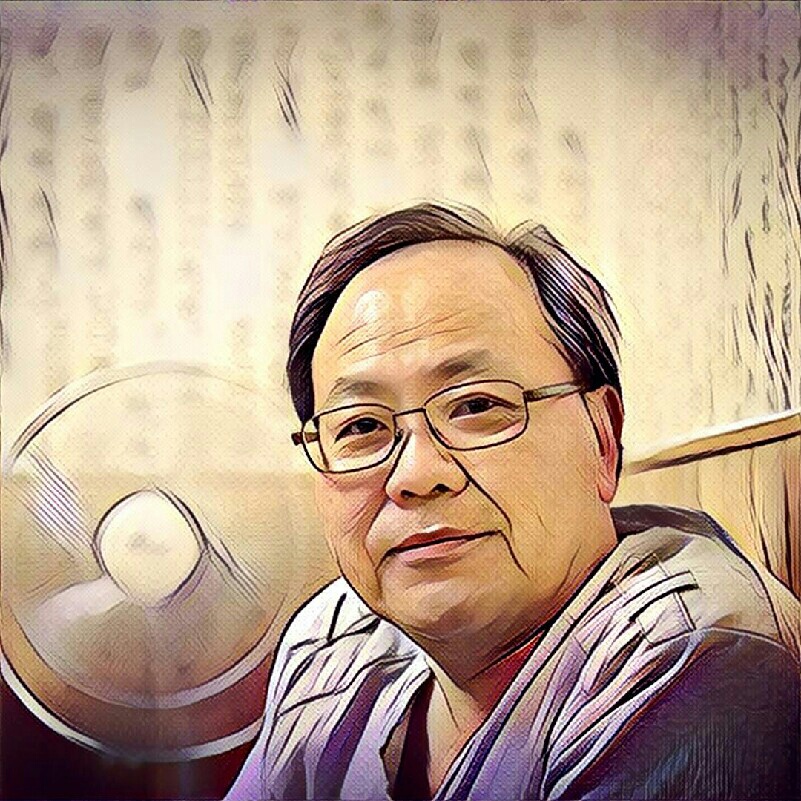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추억의도시
- 시환이#승원이#아다미순대국밥#탐앤탐스#두열이와통화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익숙해질 때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에디 히긴스 트리오#재즈 #피아노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하늘을 주제로 한 팝송#제목 몰라도 #들으면 아는 노래
- 碑巖寺
- 승룡
- 광진이#광진#조광진#오윤석#윤석이#윤석#허석#석이
- 황우창
- 세영이#하세영
- 하창용#민일식#여름방학#겨울방학#과외선생님#고모#광교공군풀장#시민의원#팔달산#푸른지대#중앙극장#미모사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명욱.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자이안트 강마담 010 5228 –7231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젊은 날 그 기억
- #스탠드바#대부스탠드바#인터내셔널스탠드바#An An#백악관#카페#Camus#조이너스#자이안트#흐르는것이어찌물뿐이랴#스테이션#탄트라#뽀야#대포집#이모집#고모집#큰우물집#신포순대#버드나무집#
- 이어령#눈물한방울
- 랩소디 인 블루#이인해글#한길아트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호경형님.#영준형님
- 오블완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티스토리챌린지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이백과 바보 본문
이백과 바보
저녁노을이 스며들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슴속의 이야기들이 술과 함께 흘러나왔다. “이 백, 나 바보 맞지?”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친구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호수가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다시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내 가슴속에서 퐁당 소리가 났다. 마치 냇물처럼 잔잔한 소리였다.
“너의 가슴은 언제나 고요했지,” 내가 말했다. “호수처럼.” 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아 보았다. 그의 손에서 피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놓았다. “미안해,” 내가 속삭였다. “나는 칼이었어.”
친구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는 말했다. “너의 손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는 보석이야,” 그는 덧붙였다.
오래전, 국어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말했다. “너는 두 보이고, 친구는 이 백이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늘 함께였다. 아차산을 뛰어오르며 호연지기를 길렀던 그 시절,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무뎌져야 친구가 나를 편하게 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이 백이 맞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가 맞고.”
오늘 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술을 마셨다. 나는 소갈증이 있었고, 친구는 다이어트 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나의 진정한 친구, 이 백인 친구는 나를 끝없이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무한한 애정을 느끼며,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노을이 짙어지는 저녁,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너는 언제나 나를 빛나게 해 줘.” 친구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호수처럼 고요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우리의 우정은 말없이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가장 큰 위안으로 채웠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함께였다.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겨울비 (0) | 2026.02.01 |
|---|---|
| 빈 걸음 (1) | 2026.01.21 |
| 동인천, 그리움의 시간들 (1) | 2026.01.06 |
| 젊은 날, 그 기억 (1) | 2026.01.04 |
| 꿈길에서 만난 이름들 (0) |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