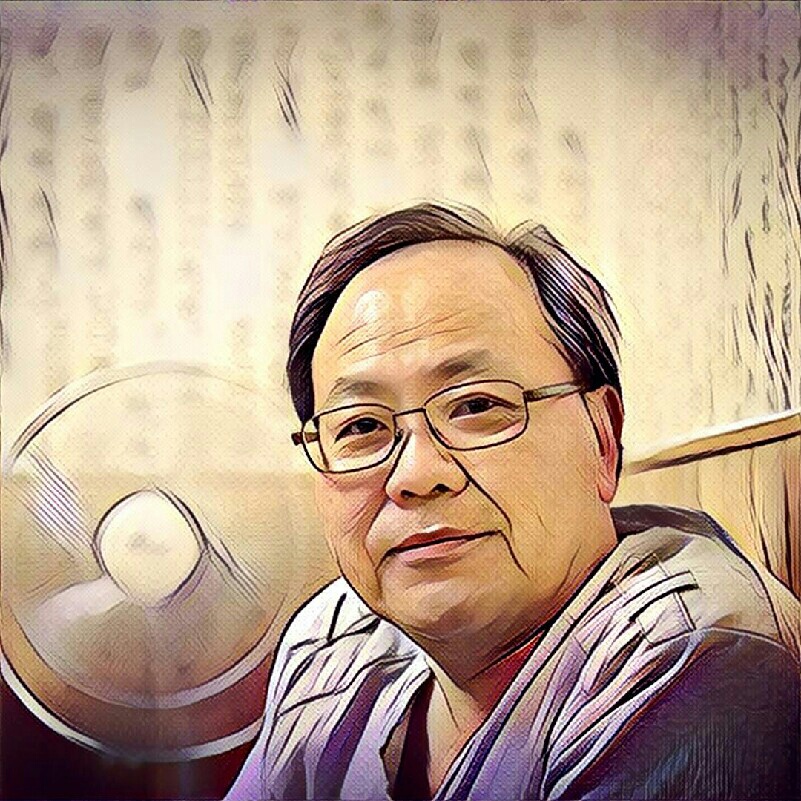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하얀닭곰탕칼국수
- 학교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졸업
- 추억의반추#나이듦#어머니#아버지#유동석#이기경#장정석#조광진#그리고 그 이름들..
- 황윤기
- 김활란개인공원"망우리
- 동석형기일#6월26일
- 하얀뚝닭곰탕
- 초계모밀소바
- 광진이#윤석이
- 당화혈색소6.7#녹내장주의#아마릴정1일투여량1알줄임#자월보신탕24년3월폐업
- 김유풍#한광덕#공종학#김현관
- 꼬챙이#꼬기배
- 부천중동 황소갈비#설빙#이자카야 생마차#두열이 부부#윤석이부부#허석이 부부#형과니부부
- 개항장야행
- 벽제승화원#기수형#파주광탄#서현공원#인천승화원#인천가족공원#별빛당#어머니#39호#수창이#6호 #만월당#기경이#60호
- 이병철#고진옥#김용호#오일근#???
- 닭곰탱이신포점#맛있는꿈#이정숙
- 선후배정모#전가복#MBC#우연이#큰애#석민#튤립5송이#
- 모처럼 수봉산에 올랐다.
- #휴양지의 음악 #코파카바나 #배리 매닐로우
- 추석#한가위#인사말
- #수창이#농업방송인터뷰색다르고남다른사진디자인강의#사진디자인 #백구진주 #송월동동화마을#화안카페#파리바게트
- #이상준#석선녀#용유출장소#재무계#건축과#신설동#선녀바위#꽃게#용유#최현미
- 용자회#광진이부부#두열이부부#석이부부#윤석이부부#현관이부부
- 황윤기의 세계음악 여행dj
- 황철현#꾸지뽕삼계탕#카페포조#우현갤러리#빈티지뮤직카페#찬송교회#이영경#스피커메이커#우현로90번길19-11#01038150679#동인천
- 수창이#한영대#우성훈#성용원#조봉환#카페쟌피#마루카페
- 무릉계곡#김금복#미천골#김석민#김현관
- 유태식과종성이
- 꾸지뽕삼계탕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부고에서 도리를 깨닫다 본문
부고에서 도리를 깨닫다
얼마 전, 졸업 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동창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달라는데 난감하기 그지없다. 본시 부고라는 것이 호상이 직접 하여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상주나 가족이 하는 것인데 말이 동창이지 졸업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쓴 소주 자리 한 번 없다가 이제야 내가 동창 입네 하며 서슴없이 격에 없는 부고 얘기를 하는 품새가 영 마뜩잖은 까닭이다.
나야 연락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졸업 후 한 번 보지 못한 친구도 많을 텐데 당사자가 직접 선별해 연락해야 옳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안 그래도 달포 전 동창모임에서 필요한 시기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몇몇 친구들의 얘기가 화두에 올랐던 터라 은근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동창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잃은 행동임을 알 수 있겠다. 사실 오가다 인사치레로 내밀었던 명함으로 청첩도 보내고 부고도 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으니, 이 친구만을 나무랄 형편도 아니다.
어찌 되었건 학창 시절을 함께 지냈던 동창으로 맺어진 인연인 것을 어찌할까, 당사자로서는 친구들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도리로 판단하였으니 다소의 결례쯤은 친구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리라. 다만 이전에도 자기 필요에 의해 동창회를 이용한 친구가 있어서, 몇몇 친구들이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우려하는데, 그로 인해 친구 간에 불신의 골이 형성될까 그 점이 염려될 따름이다. 결국 내키지는 않아도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었지만 장례식장에 참석한 친구들은 몇 명 안 되었고, 그 점이 서운했는지, 바빠서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부탁 전화 이후로는 내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우려가 기우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친구 덕분에 새삼스레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도리는 한자어로 길을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사람이 가는 길을 뜻함이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려면 성정과 필요에 의해 스스로 그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먼 곳을 가기 위해 평평하고 잘 다져진 길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 것이고, 소롯길로 만족을 한다면 적당한 노력으로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터이다. 그게 살아가는 법이고 인지상정인데 간혹 남이 애쓰며 닦아놓은 길에 무상 안주하여 마치 제 길인 양 내 달리는, 도리에 먹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구를 칭하기에 앞서 스스로 되돌아보며 반성할 부분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품앗이와 두레나 계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구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씩 생겨난 규범들인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규범인만큼 단순하지만 단순함이 외려 커다란 역할을 했고 그 정신만큼은 면면히 흘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인 관계는 그 사람의 개성과 역량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이와 폭을 기준하는 정답은 없겠지만 관계의 역할을 짊어질 최소한의 예와 정성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모두 다 틀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미리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과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이제 모임의 단위는 최소한으로 작아졌는데, 이에 대비를 하지 않다 보면, 필연코 친구와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워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내가 알던이의 수첩에 있던 다짐처럼 내 이름이 지워지는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친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기억에서 잊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잊히거나 지워지는 사람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마저 잊게 될 것이다. 지워지기보다는 지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12. 5. 22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찔레와 장미 (0) | 2022.12.06 |
|---|---|
| 나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0) | 2022.12.06 |
| 4월의 마지막 날, 교육 유람[遊覽] (1) | 2022.12.06 |
| 산소를 만드는 여인 (0) | 2022.12.06 |
| 벚꽃을 기다리며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