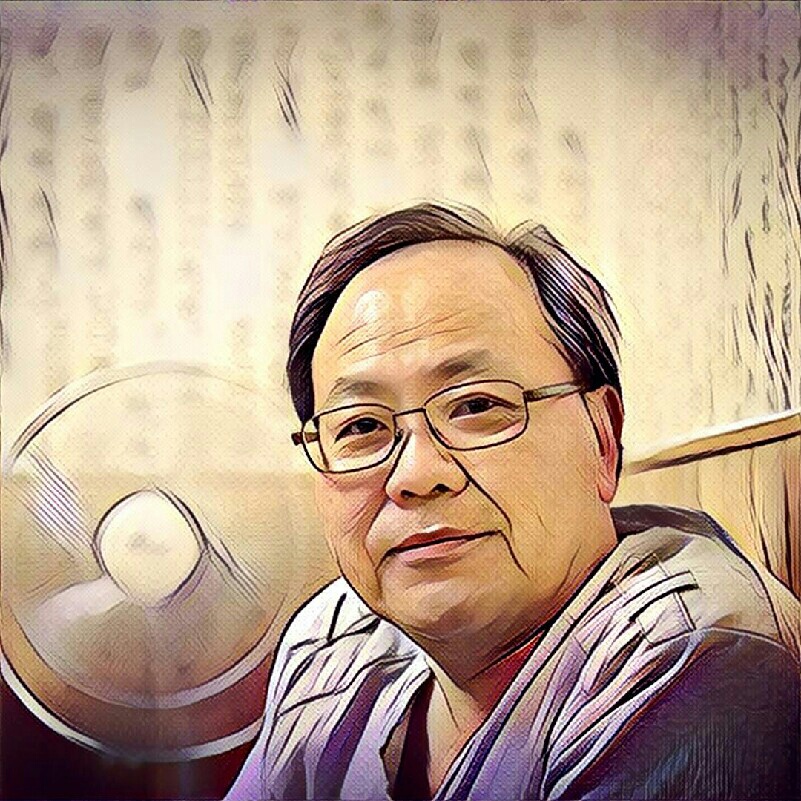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황윤기의 세계음악 여행dj
- uptempo
- 황윤기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y.c.s.정모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60bpm
- 오블완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1mm 치과
- 당화혈색소6.7#녹내장주의#아마릴정1일투여량1알줄임#자월보신탕24년3월폐업
- piano
- 모처럼 수봉산에 올랐다.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70-80bpm
- male base vocal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티스토리챌린지
- 추석#한가위#인사말
- male vocal
- jzzz&blues
- 광진이#윤석이
- 황철현#꾸지뽕삼계탕#카페포조#우현갤러리#빈티지뮤직카페#찬송교회#이영경#스피커메이커#우현로90번길19-11#01038150679#동인천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Saxophone
- blues&jazz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용자회#광진이부부#두열이부부#석이부부#윤석이부부#현관이부부
- #휴양지의 음악 #코파카바나 #배리 매닐로우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지 곳 리 본문
지 곳 리
사십여 년을 거슬러 죽미고개엘 내려서니 짙은 솔향기가 가슴속에 퍼지고, 타고 온 시외버스는 가쁜 숨을 몰아쉰다. 여기서부터 시오리 길 ~ 누런 황톳길! 걸어도 걸어도 외가댁은 멀기만 하다. 첫 마을 세교리 어귀에는 세월의 더께가 엉켜있는 낡은 정미소 앞에 서낭당((城隍堂))을 모신 늙은 느티나무가 졸면서 나그네를 맞고, 어머니의 모교인 광성 국민학교가 왼쪽 산자락에서 작은 미소를 짓고 있다.
한참 더 숨 고르고 나서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 왼편 길을 돌아서니 그제야 실개천과 누렇게 팬 이삭들 속에 숨은 외가댁이 멀리 보인다. 임진왜란 때 권 율 장군이 산 밑에서 먹을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왜구를 속이려고 물이 풍족한 것처럼 쌀로 말을 씻기는 계책을 내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세마대 (洗⾺臺) 아래 지곳리란 동네! 어머니의 고향이다.
동구 밖에서도 들리는 컹컹대는 복구의 짖는 소리와, 감나무 밑에서 꼴을 우물거리며 음~ 머 우는 누렁이의 쉰 목소리는 그대로 외할아버지의 거친 손등과 깊고 골진 주름살을 떠 올리게 한다. 니스칠이 벗겨져 결이 그대로 보이는 낡은 나무문패에는, 오산읍 지곳리 **번지 ⾦ 千興이라고 외할아버지의 존함이 먹물로 또박또박 씌어 있다 문패 바로 밑자락 삐삐선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누렇게 바랜 두툼한 비닐봉지 속에는 오래된 訃告들이 들어있다. 하나하나 외할아버지에게 아픔을 전해주던 슬픈 소식들이지만 흉한 소식은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는 삶의 한 부분을 엿보게 한다.
삐~이~ 꺼억! 한 발을 성큼 들어야 넘을 수 있는 대문의 돌쩌귀 소리를 들으며, 천둥벌거숭이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넓은 앞마당에 흰 차일이 쳐지고, 모처럼 환하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조용한 마을의 고요를 흔들어 댄다. 느닷없는 장고소리와 기생들의 “에헤라~디여”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지며 흥을 더한다 산해진미가 차려진 커다란 교자상 앞에 의관을 정제한 외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가족들이 병풍을 치며 서있다. 시커먼 천을 뒤집어쓴 사진사와, 커다란 사진기의 시커먼 주름들과, 새파랗게 외눈을 부라린 렌즈가 어린 나를 주눅 들게 한다.
부엌에 딸려 있는 광속에는 언제나 맛있는 엿이 드럼통째로 놓여있다. 외양간 옆의 또 다른 광속의 낮은 시렁 위에는 호두와 땅콩 자루가 늘 나를 유혹한다. 안방 다락에는 제사 지내고 남은 약과며 온갖 과자와 사탕 그리고 과일, 곶감들이 지천이다.
하늘이 아주 맑고 무척 파랗던 날! 무지개 사탕을 빨고 있는 내게 마당 건너 여자아이가 다가와 "한 입만, 한 입만" 칭얼댄다. 들은 체 만 체 하는 내게 파란 눈을 치켜뜨던 그 여자아이는 무섭게 달려들어 내 얼굴을 할퀸다. 나는 울며 돌아서고, 여자 아이는 날름 그 사탕을 집어 입속에 넣고 몇 번 "에퉤퉤" 하고는 , 한 쪽볼을 불쑥 불린 채로 의기양양 미소 짓는다. 세상에서 나눔과 욕심의 차이를 처음 배웠던 순간이다.
시골 웅덩이에는 많은 생물들이 산다. 논둑에 구멍을 낸다고 잡히는 대로 패대기 쳐져 말라죽는 웅어들과 물방개, 소금쟁이, 거머리, 조그만 물고기, 유충들, 그리고 미꾸라지~ 찬 바람 부는 겨울이면, 집 앞 논의 웅덩이에 동네 청년들이 모여든다. 그 무리들에는 늘 막내 외삼촌이 우두머리가 되어 커다란 바가지 양쪽에 기다란 동아줄을 질끈 동여 매고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연실 물을 퍼낸다. 꼬물꼬물 하는 미꾸라지중에 제일 큼지막한 몇 마리는 석쇠에 올려져 소금구이가 되어 조그만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있는 내 입속으로 연실 발라진다.
배 씨 아저씨네는 칠 남매를 두었다. 맘씨 좋은 아저씨의 투박한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정겨움을 주고 있다. 어머니의 먼 친척인 아저씨는 외할아버지 댁과 작은 논 하나 사이를 두고 있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아는 집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풀방구리처럼 들락거렸다. 빙 도는 신작로 길은 조금 멀고도 심심해서, 잠자리나 메뚜기를 휘휘 쫓아가며 콩대 헤치는 맛에, 좁은 논둑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다니곤 했다.
작은 아들 유천이와 작은 딸 옥희와는 한 살씩 위아래 터울로 동무하며 지냈는데, 외가댁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다니고부터는 방학 때마다 내려가 어울려 지내던 소중한 동무들이다. 서랑리 방죽에서 썰매도 타고, 멱도 감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까르륵 웃어대며 뛰 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아픈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서랑리 방죽에 빠져서 가버린 현수는 외갓집에서 보낸 시절의 가장 슬픈 기억을 안겨 준 동생이다. 유난히 나를 잘 따르고 수줍게 웃을 때 가지런히 보이는 하얀 이가 돋보이던 아이였는데.. 몇 년 전 우연히 동인천에서 현수 오빠를 만났다. 현수 오빠는 아직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어 마주 하던 술잔에 눈물을 담아 마실 수 밖에 없었다. 부디 저 세상에서 넋이라도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움
날벌레 날아들까 피워놓은
쑥잎 파리 한 줌에서
숨 죽이듯 피어내는
아른한 연기 속에
성긴 멍석 베개 삼아
까만 하늘 쳐다보면,
아롱아롱 별들의
춤사위가 펼쳐진다.
춤추는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니 별 내 별 찾아보다
밤 뻐꾸기 소리 자장가 삼아
엄마 품을 그리며 한잠이 든다.
고향은 마음의 잠자리이며 삶의 숨통을 열어가는 소중한 추억이다. 지곳리는 어머니에게 고향이고 친정이며, 안식처가 되듯이 내게도 어린 시절의 꿈과, 아픔과 추억이 똬리처럼 오롯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갑갑한 일상이 이어지는 날이면, 그 옛날 어리고 순수한 작은 영혼이 노닐던 작은 실개천의 조잘거림과, 웅덩이 속 물방개의 잦은 발짓이 눈에 밟히고, 너른 서랑리 방죽의 싸한 물안개 속에 젖어있는 사춘기 시절의 나를 그려보며, 세마대 오르는 작은 오솔길을 산책하고픈 아련함을 반추한다.
2009.12. 20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道⼠ 를 만나다 (0) | 2022.11.29 |
|---|---|
| 봄을 심다 .. 웃어 .. 그리고 .. (0) | 2022.11.29 |
| 10월은 잔인한 달 (0) | 2022.11.28 |
| 신포동의 경양식집들 (1) | 2022.11.28 |
| ⿓ 遊 回 想 (용유회상) (1)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