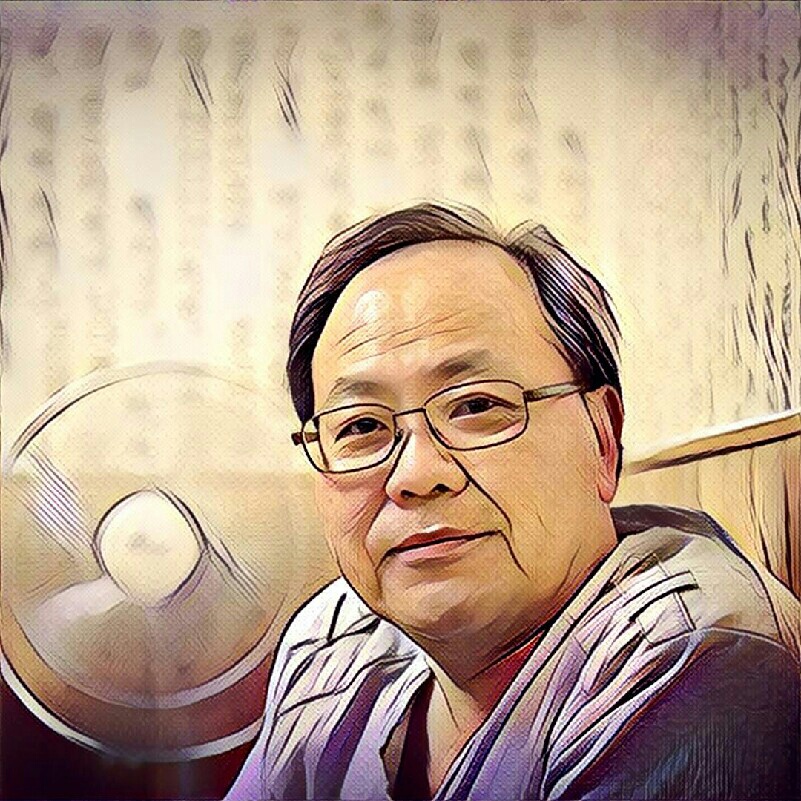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휴양지의 음악 #코파카바나 #배리 매닐로우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티스토리챌린지
- 모처럼 수봉산에 올랐다.
- 추석#한가위#인사말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y.c.s.정모
- Saxophone
- 광진이#윤석이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황철현#꾸지뽕삼계탕#카페포조#우현갤러리#빈티지뮤직카페#찬송교회#이영경#스피커메이커#우현로90번길19-11#01038150679#동인천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piano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70-80bpm
- 1mm 치과
- male base vocal
- 황윤기의 세계음악 여행dj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blues&jazz
- 60bpm
- 오블완
- jzzz&blues
- 용자회#광진이부부#두열이부부#석이부부#윤석이부부#현관이부부
- 황윤기
- 당화혈색소6.7#녹내장주의#아마릴정1일투여량1알줄임#자월보신탕24년3월폐업
- uptempo
- male vocal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엄마와 엄니 본문
엄마와 엄니
나는 엄마보다 엄니라는 호칭을 쓴다. 나이도 있으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기는 민망하여 그냥 엄니라고 부르면서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엄마라는 말을 너무도 일찍 떼어 버렸으니 그 사연이 꽤나 어처구니없다.
예 닐 곱살 무렵의 어느 날, 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다. 잠시 마실을 가신 듯했지만, 불현듯 눈앞에 항상 보이던 엄마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허전함을 지나 무서움이 온몸을 지배하며 무의식적으로 문 밖으로 뛰쳐나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그냥 달렸다. 골목을 빠져나와 신작로를 달리고 다리를 건너 엄마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안절부절못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헤매다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딜 다녀오냐면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셨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만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어린 가슴에는 왠지 모를 허탈감과 알 수 없는 배반감을 느꼈고, 엄마라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떼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혹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하실지 모르나 그 일 이후로 엄마라는 호칭 대신에 "있잖아" 나 아예 호칭을 생략한 채 본론부터 얘기를 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국민학교엘 들어가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요 와 ~습니다 체로 대화의 끄트머리가 바뀌게 된걸 어쩌란 말이냐?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던 시기의 우리 집 가세는 형편없었다. 호시절을 잠시 겪기도 하였지만 아버지께서 동업을 하셨다가 상대의 빚까지 떠안는 바람에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에다, 울화병으로 늘 술을 찾는 아버지 덕분에 쪼들리는 살림살이는 차치하더라도 늘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다.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야 자식의 입장을 생각한 아버지께서 가장의 책무를 되새긴 이후부터 다소나마 숨통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 시기에는 다시 엄마라고 부르며 응석을 부릴 처지도 아니거니와 가정 경제를 책임진 어머니의 손과 발이 잠시도 쉬실 틈이 없어 대화를 할 시간적인 여력도 없었다. 결국 그 시기의 어려움이 스스로 성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집안에서의 생활보다는 집 밖으로의 도피가 가장 무난한 방법이었으며 그 장소를 도서관으로 잡은 것은 어린 나이에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어머니라는 호칭은 내게 아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인지는 몰라도 잘 부르지도, 부르고 싶지도 않은 단어이다. 지금은 어머니라는 호칭보다 “엄니”라는 엄마와 어머니를 섞어서 만든 조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은 엄마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푸근한 사랑과 애틋함을 비슷하니 느낄 수 있고 어른이 쓰기에도 무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훨씬 그 정감이 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엄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시점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아내와 혼인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처제가 셋이고 처남이 둘이다. 육 남매가 대략 두세 살 터울이니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인어른께서 당신의 신접살림부터의 부부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요 당신의 어려움을 큰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싫으셔서 장남인 내게 혼인의 조건으로 적어도 일 년을 밖에서 생활한 뒤 본가로 들어가서 살라고 제시하셨고 나의 부모님도 역시 동질감을 느끼셨는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약속대로 일 년뒤 본가로 들어가 생활하였는데 붙임성 있는 아내는 “어머님 어머님” 하는 여우짓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안은 늘 구순하였고 더불어 아들인 나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차분은 하지마는 조금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엄니라는 다분히 아부성 짙은 호칭을 쓰게 되었다. 우리 애들은 당연스레 나와 아내에게 엄마와 아빠라고 부른다.나 역시 아이들에게 나 자신을 호칭할 때 아빠가~ 아빠는~ 이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나는 자의식을 느낀 지 불과 몇 해밖에 불러보지 못한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고 싶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체면도 따지다 보니 아예 부르지 못할 것 같아도 언젠가 한 번은 불러보고 싶다. 내 아이들이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엄마 하며 부르듯이 엄니에게 엄마라고 꼭 불러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부르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 없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슴에 다가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는 세상의 많은 이들도 느끼는 바이니 새삼스럴 것도 없지마는 당사자 한 사람마다의 애틋함이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엄니에게 엄마라고 불러 봐야 만 할 가장 큰 이유다..
“ 엄 - 마 ”..
2010.01.12 11:37

90년 초 제주도에서의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