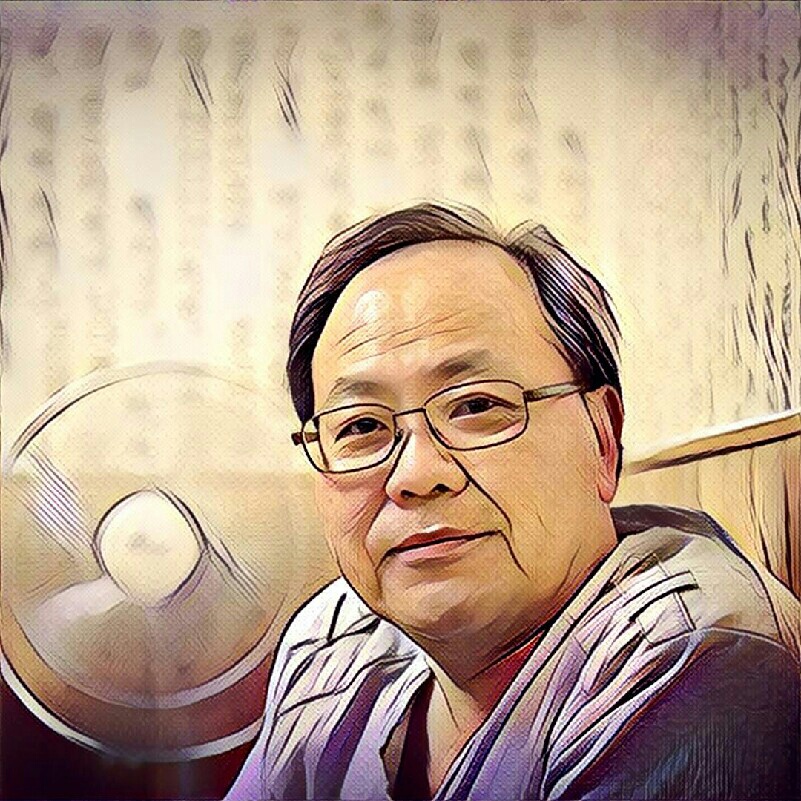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익숙해질 때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60bpm
- 이어령#눈물한방울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황우창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티스토리챌린지
- 1mm 치과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碑巖寺
- 추억의도시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y.c.s.정모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male base vocal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오블완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청관(淸館) 본문
청관(淸館)
이 글이 나가게 될 25일은 바로 음력 설날이다. 요즘은 설날이래야 별다른 감흥도 없이 넘어가는 평범한 명절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맞던 설은 지금과는 딴판인 가슴이 설레는 큰 명절이었다. 때때옷을 입고 새 신을 신는 날, 떡국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 어른을 뵙고 세배 절을 올리고 예쁘다는 칭찬과 세뱃돈을 받는 날,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실컷 노는 날. 일 년에 한번 밖에 없는 꿈같은 날이었다. 어찌 기다려지지 않겠는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는 상상조차 안되는 그러한 15일간이었다.
이뿐 아니라 인천에서 자라던 어린이에게는 청관의 설놀이라는 또 하나의 설잔치가 곁들여 있었다. 제야(除夜)놀이부터 시작해서 대보름날 원소절(元宵節)에 끝나는 춘절 15일간 청관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꾀죄죄하던 옷을 벗고 깨끗한 설빔으로 새 사람처럼 보이는 청인들이 큰 길을 서성댄다. 점포마다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영춘길자(迎春吉字)를 쓴 빨간 종이를 문짝과 기둥에 붙이고 색등을 단다. 집안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와 요란한 꽹과리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해가 저물면 집집마다 긴 장대 끝에 불딱총(폭죽)을 수백 개씩 매달아 놓고 불을 당긴다. 번쩍이는 불꽃과 총알이 터지는 것 같은 폭음이 쉴 사이 없이 눈과 귀를 놀라게 한다. 웅성대는 청관의 밤거리의 소용돌이를 헤쳐가면서 서성대던 어린이들의 황홀한 기분은 요즘 어린이들이 컬러텔레비전에서 전쟁영화를 보는 이상이었을 것만 같다. 이른 아침에 동네 악동들과 길가에 흩어져 있는 불발탄을 주우러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였다. 조끼 주머니에 가득히 줍는 날에 느끼던 승리감과 집에 돌아가서 터뜨릴 기대감은 대단했다.
대보름날에는 원소절이라 하여 춘절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시내 대로를 누비는 축제행렬이 있었다. 무룡(舞龍)이라는 춤추는 용을 중심으로 악대가 따르고 그 뒤에는 <꼬우처오(高鷺)>라고 부르는 높은 나무다리를 타고 활보하는 『삼국지』와 『서유기』의 주인공들로 분장한 가장인물 수십 명이 행진을 한다. 당시에는 이 이상 가는 호화찬란한 구경거리는 없었다. 이러한 춘절놀이도 1931년에 터진 만주사변 전에 자취를 감추게 된 것 같다.
청관이란 공식지명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부르던 청국지계에 대한 통칭이었으며 지계가 폐지된 후에도 이 이름은 계속 사용되었다. 청국지계는 일본지계와 각국지계에 둘러싸인 약 5천 평의 해변 구릉 지대였다. 일본지계 와는 현 중앙동과 선린동 사이에 있는 중화루를 거쳐 <한국회관>에 이르는 언덕길이, 각국지계와는 (한국회관)으로부터 중국기독교회를 지나 오림포 스호텔 후면에 이르는 언덕길이 경계선이었다. 선린동을 청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언덕길 사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했고 지금 북성동사무소가 있는 대로가 바로 청관의 번화가 였다.
이 길은 1885년에 주한총리로 부임한 원세개(袁世凱)를 따라 들어온 동순태(同順泰)를 비롯해서 인합동(仁合東)·지홍동(誌興東)·동화창(東和昌)·동순동(東順東) 등 청국 거상들의 광대한 점포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 벼랑에 붙여 지은 건물이라 도로변은 2층이었으나 후면으로는 5~6층이 되 는 고층건물이었다. 6.25동란 때 파괴되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각국지계 언덕 위에 서 있던 존스톤별장, 영국영사관, 세창양행숙사, 오례당(吳禮堂) 등 우아한 양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던 청관 일대는 외항에서 전망하면 아름다운 한복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 뒷길에 있는 청국영사관이 쓰던 넓은 건물은 화교학교, 화교자치회, 화교상회 등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관(客棧), 잡화상, 음식점, 이발관, 목욕탕(浴池), 주택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청관은 이름 그대로 청인만이 사는 청인마을이었다.
1895년에 일본에 패전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대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개항 후 이미 청일간의 경제전쟁이 인천항을 무대로 불붙고 있었다. 인구는 일본의 삼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으나 무역분야에서는 근해 연안에서 자행하던 밀무역을 합산하면 단연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다. 1887년 무렵에는 청관에서 넘쳐흐른 청인이 내리(현 내동)와 외리(현 경동) 일대로 진출하여 화상(華商)을 차렸다. 지금은 평화각과 영풍루만이 남아 있으나 1931년에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십여 개의 화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청국은 일본을 앞질러 1885년에 서울 의주간에 전신선을 가설하여 한때 인천의 일인은 본국에 보내는 전보를 인천, 서울, 의주, 천진 (天津), 상해(上海), 나가사키(長崎)를 경유하는 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다급했던 일본은 기어이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10년 후에는 노일전쟁을 거쳐 드디어 한국을 합방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부터 인천항의 완전히 일본의 독무대가 되고 말았으나 그래도 청관에 뿌리를 내린 청상들은 끈질긴 기반과 뛰어난 상술을 가지고 꾸준히 버티어 나갔다. 한염해운(韓鹽海運)의 전용 부두였던 엄부두(鹽埠頭) 앞바다에는 30년 무렵까지 '짱크'라고 부르던 독특한 모습을 한 검은색 중국 풍선이 출입하고 있었다. 산동지방에서 가져오는 천일염(호염(胡鹽)이라고도 함), 고추 잡곡, 지물류를 풀고 건어, 해삼, 새옷살, 조갯살 등 해산물을 싣고 갔다. 그러던 중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관의 상권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20년대부터 청관은 청요리로 유명했다. 지금은 오림포스호텔을 마주 바라보며 의연하게 서 있는 고색이 짙은 공화춘, 작년에 헐린 중화루, 동양석유 주차장자리에 있던 동흥루(송죽루 전신) 등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류 청요리집이었다. 그중에서도 중화루에는 북경에서 온 주사부(周師父) 라고 부르던 일급 주방장이 있어 정통 북경요리로 유명했다. 겨울철에 사용 하는 백동(白銅) 중탕식기와 구리로 만든 백알병은 인상적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대관원(관수동에 있음)과 금곡원(소공동에 있음)이 있었을 뿐 청요리는 대단치가 않았었다. 서울 사람들이 청관의 청요리를 먹기 위해 인천으로 원정을 오는 일이 유행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제 청요리가 중국요리로 이름이 바뀐만큼 요리도 많이 변했고 먹는 사람도 달라져서 인천의 청요리 자랑도 먼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북성동의 오병헌(吳炳憲) 동장과 오랜만에 청관일대를 더듬어 보았다. 옛 모습을 찾기 힘들만큼 모든 것이 변모하고 있었다. 바다를 향한 거상들의 점포가 서 있던 언덕은 함포사격으로 파괴된 폐허 그대로였다. 오림포스호텔 후면에 'Chemulpo Tabacco Co.' 라는 이색적인 영자 상호가 페인트로 써 있던 영미연초회사의 오래된 벽돌건물은 화교학교 기숙사로 변했고, 전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라곤 지금 수정(壽亭)이 자리하고 있는 서양 식료품상점 의생성(義生盛)과 공화춘 뿐이다. 몇 집 남지 않은 퇴락한 2층집에는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소리없이 살고 있다.
해방 후에 개정한 선린동이란 청관의 동 이름도 북성동 제 5통으로 흡수 되었고, 2천명이 넘던 청인이 들끓던 이 지역에 지금은 5백여 명이 살고 있을 뿐이라 한다. 현재 전국 화교인구가 약 3천명이라고 하니 태반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셈이다.
청관의 옛 이야기를 들으려고 3대째 이어 내려오는 공화춘의 우홍장(于鴻章)주인을 찾았더니 대만 여행 중이라서 화교협회를 들렀다. 40대로 보이는 회장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옛 일을 모르고 있어 몇 가지 현황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젊은 세대는 거의 대만에서 일하고 있거나 미국과 동남아로 진출하여 의사, 전문기술자, 학자로 활동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은 늙은이와 무기력한 젊은이 뿐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특색 있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대만의 본토인 2천만, 동남아의 화교 2천만 도합 4천만이 되는 실향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가요 매화(梅花)」와 국가 다음에 부르게 되어 있는 「중화민국송(中華民國頌)」을 작사 작곡하여 부르고 있는 요즘 자유중국 가요계의 제1인자로 꼽히는 류가창(劉家昌) 씨다. 그는 청관 공화춘 옆집 공화잔(共和棧)에서 태어나 유별나게 좋아하던 한국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대만으로 유학을 갔다가 음악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이고 청관출신이라 하여 나까지 덩달아 흐뭇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청관은 사람도 건물도 오랜 비바람으로 풍화되어 가고 있다. 100년 의 역사를 가진 청관도 머지않아 활자로만 남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이다. 새삼 영고성쇠라는 엄숙한 역사의 원칙을 되씹게 된다.
설날의 불딱총 소리가 귀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환상을 안은 채 옛 청국영사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교협회에서 씁쓸한 마음으로 빠져나왔다.
(신태범, "인천 한세기』 중에서)

'인천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우젓 골목에서 (0) | 2025.03.23 |
|---|---|
| 하인천 풍경 (0) | 2024.06.29 |
|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다녀오다. (0) | 2024.05.11 |
| 인천대공원의 단풍 (0) | 2023.10.31 |
| 러시아 사람이 그린 차이나타운과 월미등대의 풍경 (0)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