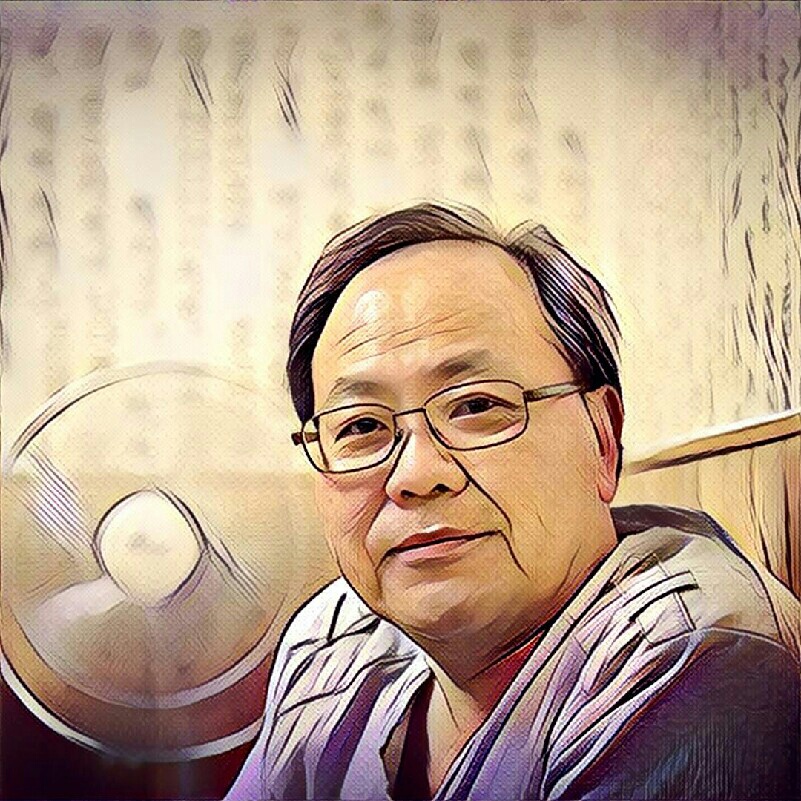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티스토리챌린지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1mm 치과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碑巖寺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y.c.s.정모
- 황우창
- 자이안트 강마담 010 5228 –7231
- 추억의도시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익숙해질 때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60bpm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오블완
- 이어령#눈물한방울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4악장 본문
https://youtu.be/Wddtr5_kf1Q?si=XzUnWFKFn_2-QRNp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4악장
(Tchaikovsky -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etique" mvt 4)
비창의 미학
상처들을 감추지 말라. 재빨리 증유되는 핏속에서 나는 맡았다. 친숙한 아편에서 스며 나오는 냄새를. 상처들을 감추지 말라. 우리들의 평범한 육체의 마디마디는 땅 속 깊이 짓밟혔을 때 무장한다. 새로운 허리띠를 졸라맨 죽음은 태양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것이 텅 빈 껍질임이 밝혀지지 않도록 또 새로 태어난 생명들의 자리가 공허한 허위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대지의 상한 피부를 붓게 하지 말라. 북의 금간 곳들을 응시하기 위해 상처에 돋은 딱지로 감추지 말라. 그리고 고통을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사람의 혀 꼬부라진 탄식으로 바꾸지 말라. 그 얼굴은 색칠한 가면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화로 바싹 마른 그 입김을 누덕누덕 기운 가슴. 죽음 머리에 이를 드러낸 웃음으로 악마 추방의 혹독함을 속이기 위해 금간 곳을 칠하라. 새로 태어나 장례식 전날 철야하는 사람들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심재(心材)의 맥박만을 전하라.
월레 소잉카(Wole Soyinka)의 「전후(戰後)」라는 시입니다.
월레 소잉카.
1986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백인 문명권에서만 받아 온 노벨 문학상이 저 아프리카의 원시문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강렬하고도 명쾌한 자기선언으로,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우선 '비아프라(Biafra)'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아프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잠시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1967년 5월부터 1970년 1월까지 존재하다가 만 3년도 채 안 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비아프라를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세월이 지나도 씻기지 않는 핏빛 비극 '비아프라의 눈물'이 화인(火印)처럼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비아프라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의 독립전쟁에서 무려 200만 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구상의 인류가 만든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되기도 했던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만도 80여만 명이 굶주려 죽은 사실이 외신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런 나라, 비아프라의 인간적 고뇌와 고발이 1986년도 노벨 문학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월레 소잉카는 나이지리아 서부의 요루바(Yoruba)족 출신이었지만 그는 비아프라의 이보(Ibo)족 편을 들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22개월간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전쟁 때에는 정부 전복 및 간첩 행위의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펜으로 안 되면 몸으로 부딪히겠다는 그의 참여정신은 핍박받는 세계 속에서 작가가 취해야 할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주로 희곡을 썼던 월레 소잉카의 작품들에는 차이콥스키의 제6번 교향곡 <비창>이 거론되거나 배경음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특별히 <비창>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1970년 1월 12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대 공세로 전쟁이 끝나던 날 비아프라 방송은 필립 에피옹(Philip Effiong) 참모총장의 전투중지 호소 말미에 200만 아사자에게 바치는 <비창>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끝내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잉카, 그가 비아프라의 비극을 얼마나 처절하게 통감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것이 현대의 지구상에서 발생했음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문학은 이제 고난과 미개인의 땅 아프리카가 아닌 원시문명으로서, 그리고 인간성의 원류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의 땅 아프리카로서, 현대 물질문명에 뒤틀리고 병들어 가고 있는 서구 문명에 거대한 파도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월레 소잉카.
이 검은 피부의 작가는 오늘도 불볕 태양의 열기로 이글거리는 아프리카의어느 대지 위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하라 아프리카여! 저 태양이 식지 않는 한."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비창) Symphony No.6(Pathetique)〉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창과 비극은 다릅니다.
비창과 비애는 다릅니다.
비창은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비창은 슬픔에 젖은 채 망연자실 앉아만 있는 그런 정서 상태가 아닙니다.비창은 슬프긴 하되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또 다른 감정을 잉태시키기 위해부산히 격동하는 그런 생산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창의 미학'에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비아프라 방송이나 월레 소잉카가 다른 하고 많은 슬픈 노래 중에서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택한 까닭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항거하여 독립하려고 했던 비아프라.
그러나 끝내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200만 명이라는 애꿎은 사람의 생명을 아사(餓死)라는 최고의 비극 속에 몰아넣은 인류 사상 드문 역사의 치부를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은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의 작곡가라 불리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 차이콥스키가 곡을 쓰는 동안 자주 통곡했다는 <비창> 교향곡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제4악장은 마치 촛불처럼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는 느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암울한 4악장에는 그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쓰면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교향곡이 마치 나 자신을 위한 진혼곡같이 느껴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그는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이 곡을 자신의 지휘로 초연한 뒤 9일 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임종 직전 자신의 오랜 후원자요, 정신적 연인이었던 폰 메크(Nadieshda von Meck) 부인의 이름을 몇 차례 부르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만 명이 넘는 시민이 나와 애도했고, 얼마 후 <비창>이 두 번째로 연주되었을 때 공연장이 울음바다로 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들어보십시오. 특히 제4악장은 마치 진혼곡과 같은 비통함이 느껴지는 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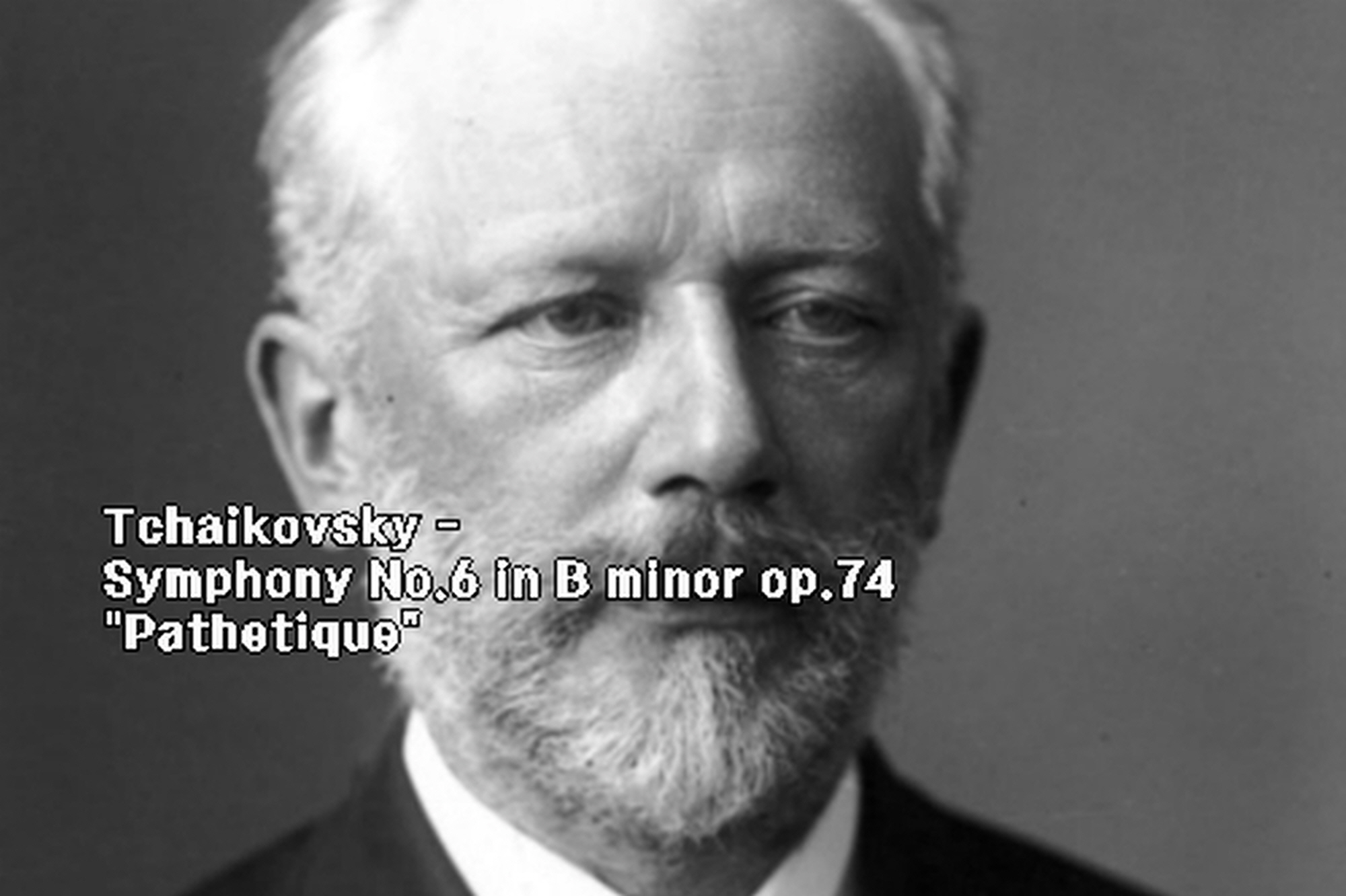
동영상 다운로드
'음악이야기 > 클래식 & 크로스오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치니의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 / 히로미 오무라 (0) | 2023.02.27 |
|---|---|
| 모차르트가 가난했던 이유 (0) | 2023.02.27 |
| je te veux 난 널 원해요 - eric satie - 조 수미 (0) | 2023.02.26 |
| Saint-Saëns : Danse macabre, Op. 40, R. 171 (죽음의 무도) (0) | 2023.02.26 |
| 만프레드 교향곡(Manfred Symphony in B minor, Op.58 / Vladimir Jurowski (0) | 202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