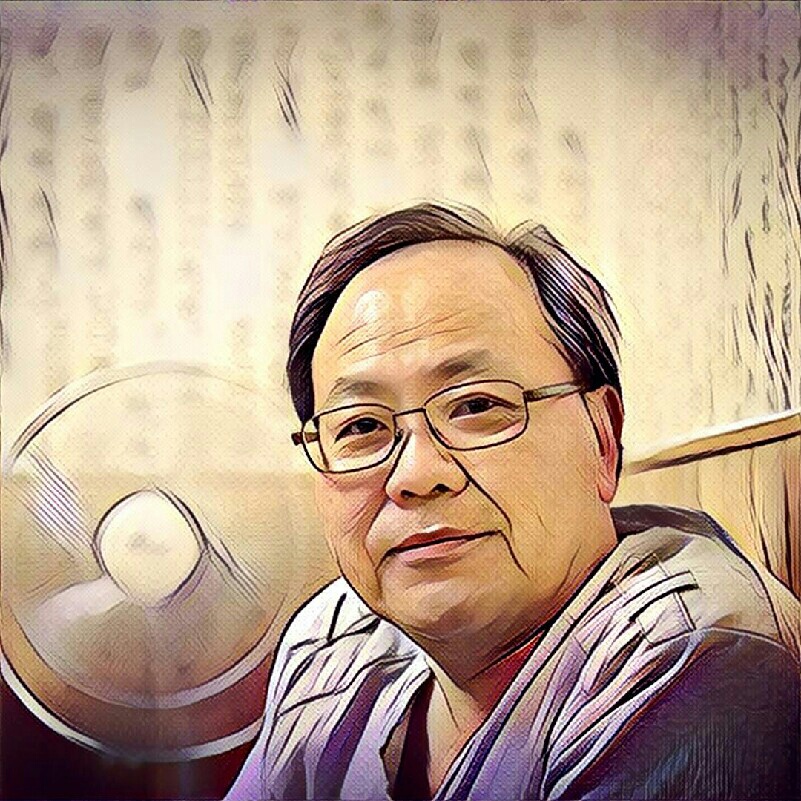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male vocal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익숙해질 때
- 당화혈색소6.7#녹내장주의#아마릴정1일투여량1알줄임#자월보신탕24년3월폐업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60bpm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piano
- jzzz&blues
- blues&jazz
- 오블완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1mm 치과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Saxophone
- 碑巖寺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y.c.s.정모
- 추억의도시
- 티스토리챌린지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uptempo
- 70-80bpm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male base vocal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차르 The Czars 의 굿바이 Goodbye(2005년) 본문
차르 The Czars 의 굿바이 Goodbye(2005년)
갑자기 주변에 적이 많아졌거나 현실이 핍진할 때 우리의 무의식은 더 화려한 꿈을 꾸곤 하지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잠자고 있는지 잘 드러내지 않는 비밀의 방은 파내려고 할수록 더 깊이깊이 지층 속으로 숨어듭니다. 사양하고 싶은 자유의 반어법일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때 묻지 않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충격에 예민한 법입니다. 특히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당하거나 버려질 때, 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공황 속에 내던져질 때 우리는 젖먹이 아기같이 무력합니다. 윤색되어 있는 갖은 욕망과 결핍이 벌겋게 드러납니다. 찬란하게, 그리고 남루하게. 무의식의 속살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것에 관한 지독한 두려움이 편집증입니다. 우아한 고독을 과다하게 음미하는 자일수록 사실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것이 무척 구차하고 고단한 때 말입니다. 원망 또는 질투와 회한과 외로움이 곪을 대로 곪았을 때 아티스트는 수명을 담보로 예술을 남기고, 감성과 안목이 있는 소비자의 컬렉션 목록은 늘어납니다. 역설, 그 공식에 따라 욕심과 허기도 증가하며, 수요와 공급의 아이러니가 지겹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편집증에 허우적거리던 아티스트나 이기적인 소비자 모두 달관하게 됩니다. 인생이 끔찍하게 재미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게 되는 지점이 언젠가는 오는 것이지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Alan Parson's Project의 암모니아 애비뉴 Ammonia Avenue」의 묵시록적 감동, 라디오헤드 Radiohead가 연주한 엑시트 뮤직 Exit Music의 염세적 서사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프 버클리 Jeff Berckley나 닉 드레이크 Nick Drake 처럼 구제할 길 없이 서늘하고 병약하고 센티멘털한 문법을 가진 이들은 왜 하필이면 제정 러시아 시대 황제를 일컫는 '차르 The Czars'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름이 그럴듯하게 다가오려면 블랙메탈이나 일렉트로니카 그룹이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사실 이들은 음산한 북유럽이 아닌, 꾀꼬리 지저귀는 콜로라도 주 덴버 시 출신의 가난한 인디밴드입니다. 마치 유화물감 살 돈이 없어 유아기적 공황에 빠진 반 고흐처럼, 물질적 몰락과 표현에의 허기가 마지막 유서 같은 가사와 멜로디를 이들에게 선사했을까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제정 군주의 칭호는, 마초의 권위가 아니라 공기 좋은 로키산맥에서 상상력을 키운 예민한 문학 소년이 보여 주는 개인기, 도발을 연상케 합니다. 차르의 음악을 가리켜 햇빛 찬란한 황금색 옥수수 밭 사이를 행복하게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시체를 발견하는 느낌이라고 한 누군가의 코멘트는 좀 유미주의의 냄새가 나지만 그럴듯하지요.
의외로 답답한 상업적 관행이 지배하는 그들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그들은, 영국의 인디 레이블인 벨라 유니언 Bella Union에서 세기말 청년들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명반들 전에.. 그러나 더 오래 Before……But Longer』 『추악한 사람 대 아름다운 사람 The Ugly People VS. The Beautiful People』 『굿바이Goodbye』를 발표합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린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 존 그랜트John Grant의 데카당스한 아우라가 마법사들의 레이블 벨라 유니언과 공명했을 테지요. 마치 태생부터 고독을 몸에 지닌 듯한 목소리와 느린 듯 에돌리지 않는 날카로움(단, 허스키한 비음을 가진 보컬리스트가 한두 명이 아닌 시대이므로 존 그랜트가 누구와 비슷하다는 식의 품평은 이제 별로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 5인조 미국 인디밴드가 고생 끝에 런던에서 비로소 꽃피운 열매가, 그들이 분출하는 기운이, 포크 록-컨트리-블루스-슬로코어-슈게이징-어덜트 컨템퍼러리-재즈 등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스타일과 장르로 일컫든 그것은 일부 소비자나 중간 유통업자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팻시 클라인, 콕토 트윈스, 라디오헤드, 캬바레 볼테르, 탐 웨이츠, 칼렉시코, 라이드, 로우, 욜 라 텡고, 스테레오랩, 콜드플레이, 밥 딜런, 마일즈 데이비스 등이 차르의 복잡한 문법에 영양소가 되어 준 목록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리는 것도 많으며 웃지 않는 범상치 않은 소년. 그의 결핍과 편집증을 욕망하고 전염되는 것은 비슷한 증세를 가진 이들에게 면역력을 키워 줄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혼돈으로 장전된 회색의 세계. 그 흔들리는 세계의 쓸쓸한 뒷모습. 서서히 부서지고 균열되어 가는 삶의 토대들, 부조리와 공황의 굉음에 몸과 정신이 몰락하는 영혼들. 그 모두에 촉수를 드리운무의식의 바다. 세상의 변두리를 떠도는 약한 존재들이 유일하게 안위하는 바다, 치명적이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트라우마가 석회질화되어 가는 마지막 시간을 담그며 치유의 주문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차르의 우아하고 창백한 칭얼거림이 그 장대한 풍경 한 구석에 출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제 군주의 화려한 의상이 아닌 남루하고 얇은 아기 옷을 입고. 상처를 주는 동시에 위안을 주는 음악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연민이 쓸데없이 강해지겠지요. 하지만 편의점의 삼각 김밥처럼, 저렴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의 미학이 우리네 인생에 선명한 표지를 남길 때에도 기묘한 쾌락을 구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음악이야기 > 록,블루스,R&B'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an't Stop Loving You - Van Halen (0) | 2023.03.02 |
|---|---|
| 존 로드 Jon Lord의 내면의 풍경 Pictured Within(1999년) 과 음표 너머 Beyond The Notes(2004년) (1) | 2023.03.02 |
| Westlife –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0) | 2023.03.02 |
| 데이비드 길모어 David Gilmour의 섬에서 On An Island(2006년) (0) | 2023.03.02 |
| The Messiah Will Come Again / Roy Buchanan (0) | 202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