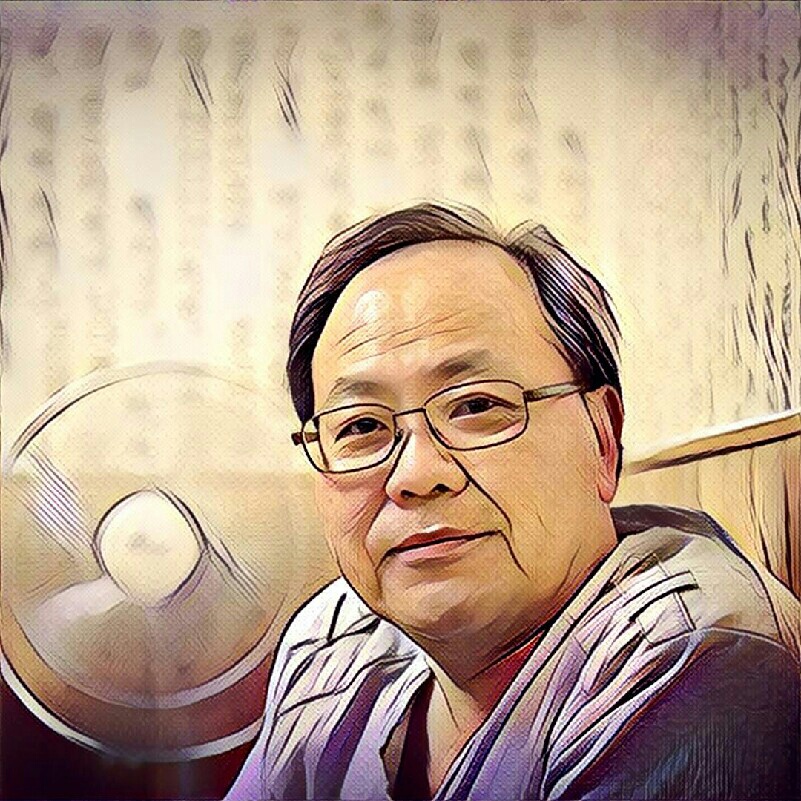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male vocal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티스토리챌린지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blues&jazz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碑巖寺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60bpm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오블완
- male base vocal
- y.c.s.정모
- 1mm 치과
- 황우창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추억의도시
- 익숙해질 때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聞蟬 / 매미 소리를 듣다 본문
聞蟬 / 매미 소리를 듣다

매미 소리를 듣다
칠월에도 초사흘 날에야
매미 소리를 처음 들었네.
나그네 신세라서 더욱 느꺼운데
변방 사람들은 이름도 모른다네.
이슬 먹고 살기에 욕심이 없어선지
가을 부르는 소리가 정이 있는 것 같건만,
나뭇잎 떨어지니 다시금 시름겨워
서늘한 저녁 바람이 기쁘질 않네.
聞蟬 / 1617년
流火初三日, 聞第一聲
羈人偏感物,塞俗不知名.
飮露應無欲,號秋若有情.
還愁草木落,未喜夕風淸.
孤山 尹善道 詩選
고산 윤선도는 정철 송강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말을 써서 자연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졌다. 송강이 호흡이 긴 가사(장가를 잘 지었다면, 고산은 호흡이 짧은 시조 (단개)를 잘 지었던 시인이다. 당대에는 아직 시조라는 이름이 없었으므로, 글자 그대로 호흡이 짧은 단가가 그에게는 제격이었다.
원래 자연의 아름다움은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달라지므로 철따라 바뀌어가는 경치를 다 노래하려면 가사가 제격이었다. 그런데 그는 한 편의 가사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단가 40수를 지어 철따라 바뀌어가는 자연의 여러가지 모습을 노래하였다.
송강의 가사에서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임금과 정치를 잊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그의 <어부사시사>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즐기는 어부의 모습만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어부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바다와 배를 삶의 현장으로 삼은 어부가 아니다. 해남에도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자주 벼슬이 주어지는, 그래서 고기잡이를. 풍류로 즐기는 사대부였을 뿐이다.
그래서 흔히 고산을 가옹(假)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을 친히 가르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목숨을 걸고 상소하였던 그가 어찌 서울의 정치 현상을 아주 잊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그는정치 현장의 갈등과 고뇌가 있을 때마다 한시를지어 표현하였다.송강의 경우도 그렇지만, 고산의 시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생을 노래한 단가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험난한 정치가의 길까지도 노래한 한시까지 아울러 읽어보아야 한다.
6권 책이나 되는 그의 문집 《고산유고(孤山遺稿)》에는 75수의 단가가 권6 하별집에 덧붙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한시가 가장 앞에 본문으로 실려져 있다. 이 많은 한시를 읽지 않고는 그의 시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한시 가운데는 단가와 제목이 비슷한 것도 많고, 제재가 같은 것도 많다. 그는 하나의 자연을 보거나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두 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의 형태로 노래했던 것이다.
그의 단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시를 읽어야 하지만, 단가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한시는 그의 삶 그 자체이다.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다니던 열네살 때부터 마지막 유배지에서 돌아와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던 여든세 살 때까지, 그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한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가 좋아하였던 사람들이 그의 한시에 나오고, 그가 좋아하였던 사람들에게 많은 한시를 지어 주었으며, 또한 그들의 시에 차운하여 짓기도 하였다. 세차례 유배지의 스산한 삶이 그려지기도 하였고, 유배지에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좋아하였던 중국 시인들의 싯귀절들이 여러 곳에 그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동영상 다운로드
https://kakaotv.daum.net/downloader/cliplink/430951034?service=daum_blog
'사람들의 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참된 여행은 방랑이다 (0) | 2023.07.12 |
|---|---|
| 우리 집으로? (0) | 2023.07.11 |
| 고려묵 (高麗墨) (0) | 2023.07.11 |
| 동파육은 소동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0) | 2023.07.11 |
| 망설임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