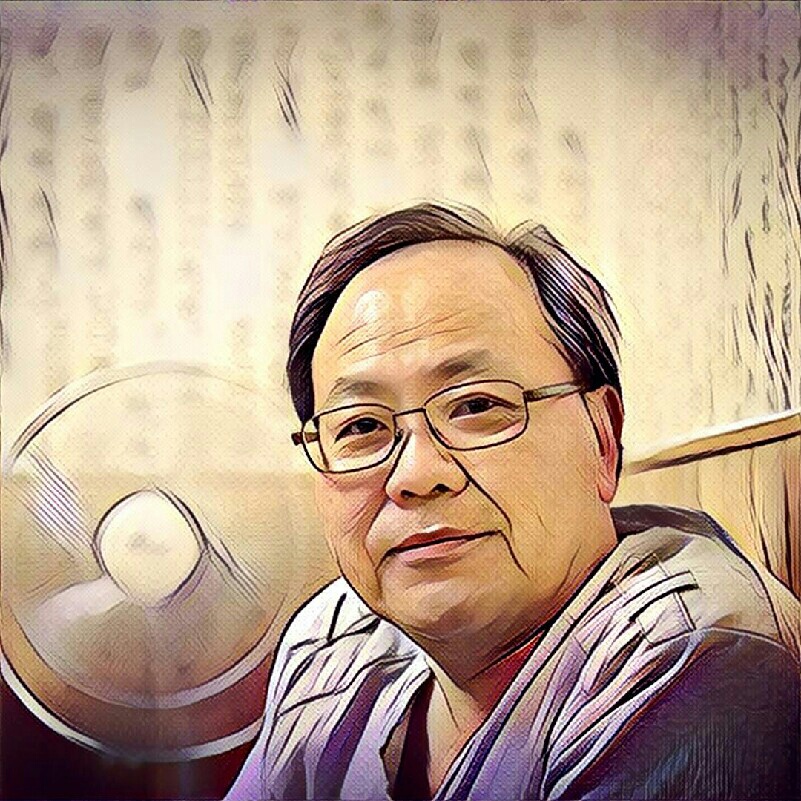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익숙해질 때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70-80bpm
- uptempo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y.c.s.정모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piano
- 碑巖寺
- 티스토리챌린지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오블완
- 1mm 치과
- 황우창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male vocal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Saxophone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추억의도시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더위를 피하는 여름날의 만남, 음주 본문
더위를 피하는 여름날의 만남, 음주
자, 이제 여름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십시오. 가까운 이들과 모였는데 시, 서, 화의 흥취를 다 즐기고 나서 이제는 거문고도 내려놓고 바둑 둘 사람은 바둑 두고 책 읽을 사람은 책 읽고 하는 모습입 니다.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유명한 문인화가 표암(約菴) 강세황(姜世 晃, 1713~1791)의 그림입니다. 이 분은 병조참의와 한성부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18세기 후반 최고의 문화예술 권력자였습니다.

강세황, <현정승집>
18세기, 종이에 수묵, 34.9×212.3(시문 포함 크기), 개인 소장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현정승집(玄亭勝集)'이라고 붙였습니다. '현정(玄亭)'이란 현곡(玄谷)에 있는 정자라는 얘깁니다. 현곡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경기도 안산(安山)을 말합니다. 강세황이 벼슬을 할 수 없는 집안 내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부정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예순이 될 때까지 과거를 못 봤지요. 그동안 먹고살 길이 없어서 처가가 있는 안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유유자적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현곡에서 놀았던 거지요.
그 현곡에 있는 정자가 강세황의 처남이 가지고 있던 청문당(淸聞堂) 입니다. 그림 속 집이 바로 청문당이지요. 그 청문당에서 승집(勝集)이라, '이길 승' 자에 '모일 집'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집과 같은 말입니다. 우아한 모임. 그럼 왜 '이길 승' 자를 쓰느냐? 이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뛰어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승지(名勝地)라고 할 때도 이 승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곡에 있는 청문당이라는 정자에 모인 뛰어난 풍류재자들의 모임'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표암 강세황이 중앙에 있습니다(거문고 옆에 비스듬히 앉아 바닥의 책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처남인 유경종(柳慶種)이 안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모여서,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헤어졌으며, 어떤 시를 썼는지가 이 그림에 다 붙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전부 시 한 수씩 썼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초복날 모인 친구들과 더불어 창문가에 앉아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누려 할 때, 느닷없이 우르릉 쾅쾅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마침내 소나기가 막 그치면서 매미가 청량하게 울었다. 이 때 우리를 반기는 음식이 들어왔으니...". 그 음식이 뭐겠습니까? 복날 입니다. (청중: 보신탕!)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음식에 남과 좀 다른 견해 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일동 웃음) 그래서 이날 개장국을 먹었답니다. 먹고 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얼큰해진 가운데, 마루에 전 부 편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피서(避暑), 즉 여름 한때를 보내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개를 지칭하던 용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컨대 황구(黃狗) 하면 누런 똥개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한자로 많이 쓰던 단어가 '집 가(家)'자에다가, 개견 변이 있는 '노루 장(章)' 자입니다. 개를 이렇게 가장(家獐), 집노루라고 불렀기 때문에 보신탕을 일컬어서 '개장국'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장국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중 가장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림의 기록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재밌게도 표암 본인의 두 아들, 처남의 아들 들, 마루에 오르지 못한 가동(家僮, 집안의 몸종)의 이름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선비들은 대부분 안산에 사는 학사(學士)들입니다. 표암이 안산에 머물 당시 안산을 주름잡던 학자들이 있는데, '안산 15학사'라고 불렀습니다. 18세기 당시는 학문이 굉장히 융성하던 때입니다. 게다가 성호(星湖) 이익(李瀷)이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쓰고, 실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 안산이랍니다.
이 여름날에 친구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는 가동을 보내서 "모월 모시에 어디로 모여주십시오" 전통(傳通)을 넣을 수 있겠죠.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집안의 튼실하고 발힘 좋은 노비에게 편지를 써주어 막 뛰어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마라톤을 하게 하는 거죠.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 400년 전에 여름날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고 피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더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이재영(李再榮)이고 호는 여인(汝仁)입니다. '너 여'자에다 '어질 인' 자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참 좋아서 제가 아예 외웠습니다.
처마 끝에 빗물은 졸졸 떨어지고, 방 안의 향로에서 향내음이 솔솔 풍기는데, 친구 서넛이 소매를 걷고 서안(書案)에 기대어 하얀 연꽃을 바라보며, 참외를 깎아 먹으며, 여름날의 번뇌를 씻어보려 하네. 이러한 때에 여인 그대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자네 집안의 암사자가 으르렁대며 자네 얼굴을 고양이 상판으로 만들겠지만, 늙을수록 두려움에 떨거나 위협을 받아 위축되어서는 안 될걸세. 빨리 오시게. 자 네 집문 앞에 하인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 가랑비를 피하는 데는 족할 걸세. 만나는 일이 늘 있는 일은 아니라네. 또한 이러한 모임인들 어찌 자주 있을까. 헤어지고 나면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을 걸세.
이런 편지를 받고 안 갈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이 초청장을 읽는 순간 바로 마누라의 붙잡는 팔을 뿌리치고, 가위로 붙잡힌 소매를 자르고서라도 빨리 친구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편지에 이런 말이 있죠. "하얀 연꽃을 바라보며, 참외를 깎아 먹으며, 여름날 의 번뇌를 씻어보려 하네." 아니, 그렇게 멋진 풍류재자들을 불러놓고 고작 연꽃을 보면서, 참외나 깎아 먹으면서 풍류를 즐긴다? 이 편지에는 '술'의 시옷 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는 필연코 술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허균이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여름날에 참외를 깎아 먹으면 번뇌를 씻고 나서, 풍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준비한 술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중기 유다른 문장가 간이(簡易) 최립(崔岦,1539~1612)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서풍류(避暑風流)는 경북해(傾北海)라. 여름날 더위를 쫓는 최고의 풍류는 바다를 기울일 만큼 마시는 술이다." 경북해, '북쪽 바다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북해(北海)는 중국 후한 말기의 학자 공융(孔融)이 태수를 지낸 땅 이름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북해'라고 하면 술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여름날 피서를 즐기는 최고의 풍류로 '술 마시기'를 꼽았습니다. 역사상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름날 술 마시기'를 하삭음(河朔飲)이라고 하는데, 황하의 북쪽 하삭(河朔)이라는 곳에서 삼국시대 때 원소의 집안 자제들과 당대 명류들이 다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신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여름날의 풍류, 하삭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름날의 풍류 중 최고가 술 마시기가 됐을까요? 너무 무더우니까, 이 더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 즐겨야죠) 잊어야죠. (일동 웃음)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는 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절을 내내 마시는 겁니다.
이 전통이 조선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었는데, 하얀 연꽃을 보고 참외를 깎아 먹으면서 마시는 술이 뭐겠냐 이겁니다. 그 시대 풍류객들이 즐긴 술이 벽통주(碧筒酒)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푸를 벽' 자에 '대롱 통' 자입니다. 푸른 대롱, 뭘까요? 연잎입니다. 큰 연잎을 잘라서 둥그렇게 맙니다. 연잎 줄기가 같이 따라오겠죠. 비녀로 연잎 줄기에 구멍을 냅니다. 대롱을 만드는 거죠. 원추형으로 만 연잎에 술을 부으면, 중국에서는 세 되 내지 네 되가 들어간답니다. 한 손으로 잎을 쥐고, 다른 손으로 대롱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대롱을 입에 딱 넣으면 술이 졸졸졸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푸른 연잎 줄기로 내린 술을 마시는 것이 벽통음입니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李奎報)의 시에도 나오고요. 조선의 웬만한 문인들은 재미삼아 여름날 이 벽통음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낮에는 벽통주를 마시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즐길까요? 그 연못에서 가장 큰 연잎을 잘라서 못에 띄웁니다. 꽃 중에서 가장 큰 꽃의 목을 자릅니다. 그 꽃을 물에 띄운 연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 고 벌어진 꽃잎 속에 하얀 유리잔을 놓습니다. 하얀 잔 속에 촛불을 컵 니다. 못의 물결을 따라서 연잎이 출렁이고, 연꽃이 따라 출렁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유리잔 속 불꽃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연못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물듭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의 여름날 연못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닐던 옛 선비들의 가든한 풍류였습니다.
흥 / 손철주의 음악이 있는 옛 그림강의 中
'사람들의 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로운가요, 그대 (1) | 2024.07.02 |
|---|---|
| 김상덕 개인전 / 자연의 조각 (0) | 2024.06.24 |
| 정원 庭園 (1) | 2024.05.16 |
| 오월 / 피천득 (0) | 2024.04.29 |
| 달고나와 소다빵 (0)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