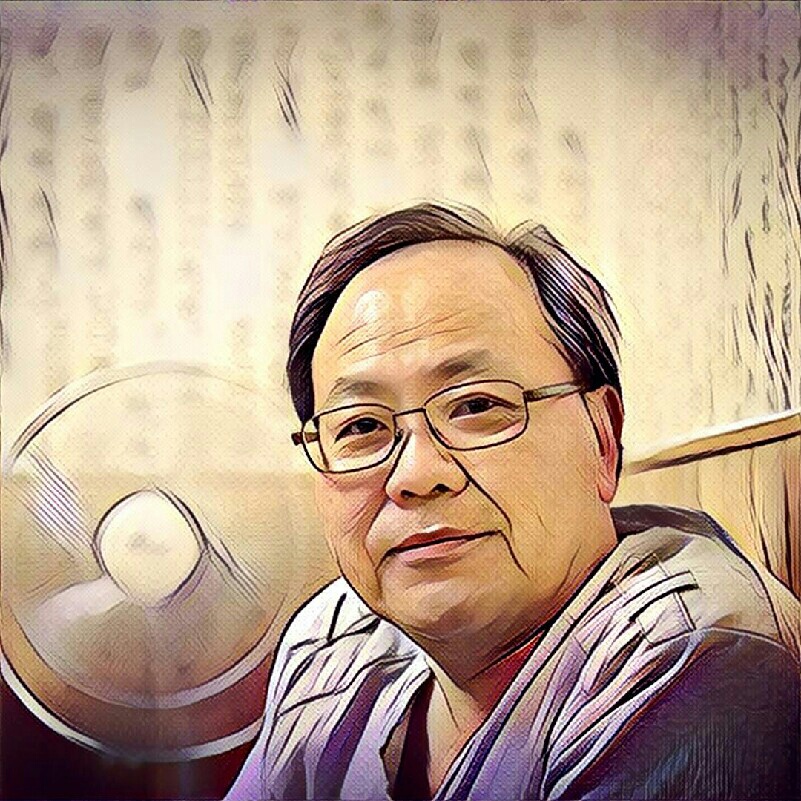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blues&jazz
- 60bpm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male vocal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당화혈색소6.7#녹내장주의#아마릴정1일투여량1알줄임#자월보신탕24년3월폐업
- Saxophone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male base vocal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y.c.s.정모
- 추억의도시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jzzz&blues
- 티스토리챌린지
- uptempo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碑巖寺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익숙해질 때
- 오블완
- piano
- 70-80bpm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1mm 치과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당신은 누구십니까? 본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릴 적 우리들은 골목 한 편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동요를 부르며 율동을 하였다. 몇몇이 손을 맞잡고 앞에 혼자 서 있는 친구를 향해 깨금발을 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합창하면 혼자 서 있는 술래는 "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후에 다 함께 "그 ~이름 아름답구나!"를 부르며 한 템포의 경연이 끝나는 아주 단순한 놀이였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놀이였지만 무리 속에 함께 어울리게 하면서 협동심과 단결력 동질감을 배우게 하는 동적이면서 합리적인 놀이였으며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한 걸음씩 성숙해졌다.
처음 보는 누군가 지금의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앞의 놀이처럼 "나는 김 현관"이라 답을 하고 더 이상의 소개가 힘들 테지만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해 온다면 질문하는 이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불쑥 이 질문을 해 온다면 수월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을까? 지금의 상태라면 전혀 답을 해 줄 수가 없겠다. 그동안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가만 보니 적어도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하거나 상대가 이해할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날 때 자아를 챙겨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하릴없는 공허함만을 안고 간다면 그보다 억울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저릿하니 찾아 들어오니 말이다.
육순을 앞두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석이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지나 온 삶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라 충고를 하는데 누구 하나 반박 없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에서 두보의 시 '곡강이수'편에 쓰인 '인생칠십고래희' 가 떠오르며 " 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와닿았다.
우리 모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온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또 누구나 묻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을 자주, 쉽게 하면서도 언젠가 정말 나에게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리라는 것은 대부분 망각하고 있다. 어쨌든 죽음은 삶의 다른 경험들처럼 여러 번 해볼 수도, 미리 느껴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의 순간에 스스로 직면해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오래전! 신병으로 인해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삶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에 지인들과 가족에게 해 줄 말들을 기록하던 그때가 기억난다. 다행히 살아남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지금까지 당시의 생각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막상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뜻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이 문제이다. 그나마 내 삶의 편린들을 글로 적고, 한 번쯤 되돌아보고 나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지금의 삶이 고마울 따름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생각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한 방법을 추론하고 있다. 어쩌면 남은 삶 동안 답이 없을지도 모를 이 질문에 대하여 종종 자문을 해가면서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어느 날 내게 다가올 한순간에, 혹여 아름다운 공적은 없을지라도 부끄럽지는 않도록 살아가는데 성심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조회가 끝나면 날마다 봄옷을 잡혀
매일같이 강가에서 만취해 돌아오네
술빚이야 가는 곳마다 늘 있는 것이지만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었다네
꽃 사이로 나비 분분히 날아들고
잠자리는 물 위를 여유롭게 나는구나
듣자니 좋은 경치는 함께 다녀야 한다고
잠시라도 서로 즐겨 어긋남이 없자꾸나
- 두보(杜甫) 〈곡강이수(曲江二首)〉 중 두 번째 시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눈이 온다 (0) | 2022.12.14 |
|---|---|
| 창룡문을 바라보며 추억을 반추하다 (0) | 2022.12.13 |
| 12월부터 시작되는 수첩 (0) | 2022.12.13 |
| 자유공원의 만추(晩秋) (0) | 2022.12.13 |
| 내 인생을 빗대어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다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