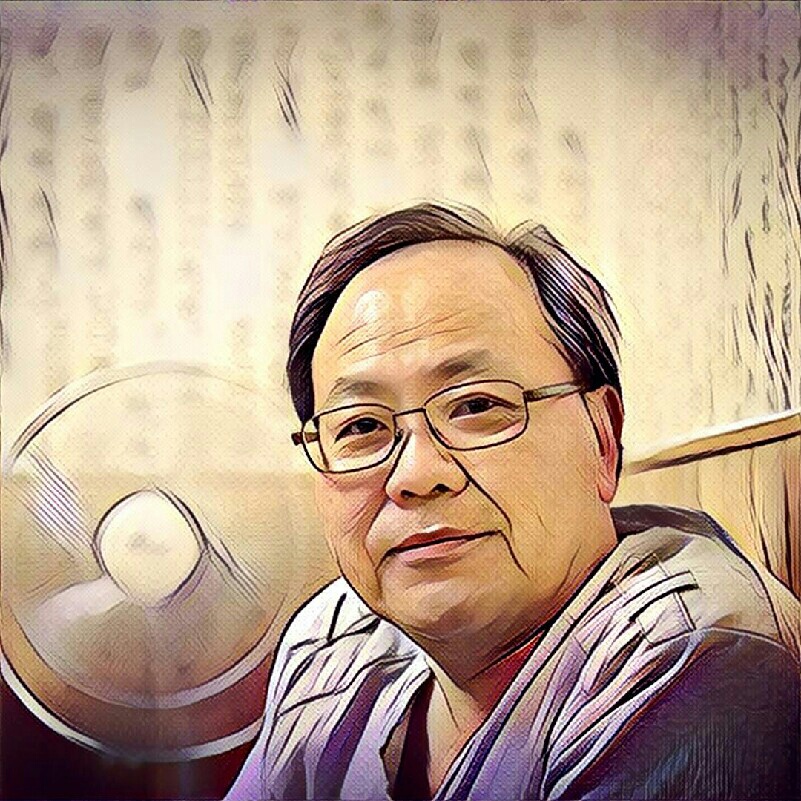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blues&jazz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익숙해질 때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male vocal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1mm 치과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추억의도시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y.c.s.정모
- 오블완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碑巖寺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male base vocal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황우창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티스토리챌린지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60bpm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강원 정선) 몰운대 [沒雲臺] - 구름도 쉬어가는 곳 본문
춘삼월에 피는 꽃은 할미꽃이 아니요
東面山川[동면산천] 돌산바위에 진달래 핀다. 정선아리랑 <산수편>중에서..

구름도 쉬어가는 곳 - 몰운대 [沒雲臺]에서 내려다본 전경
몰운대 [沒雲臺]
화암팔경 중 제7 경인 몰운대는 수백 척의 암석을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위에 5백 년이 넘은 노송이 좌우건너편의 3형제 노송과 함께 천고흥망을 간직하고 있다. 옛 전설에 천상선인들이 선학을 타고 내려와 시흥에 도취되었다고 전하며 구름도 아름다운 경관에 반하여 쉬어 갔다고 하는 몰운대 절벽 아래에는 수백 명이 쉴 수 있는 광활한 반석이 펼쳐져 있다.
입구에서 250m를 가면 몰운대 꼭대기로 바위에 서있는 소나무와 고사목을 잡고 주변을 살펴보면 강과 마을이 매우 평화스러워 보이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에, 떨어질까 두려워 발이 떨린다. 아래쪽 강가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한 폭의 멋진 산수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몰운대 [沒雲臺] 입구 삼림의 코스모스가 가을의 길손을 반긴다...

구름도 잠긴다는 몰운대의 안내 표지판

몰운대 [沒雲臺] 가는 길이 호젓하다.

몰운대 [沒雲臺]의 고사목 나무를 지탱하고 밑을 바라보는 내내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함에 현기증이 났다. 이런 감정은 비단 나뿐이 아니런가!. 동질감을 느낀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자...
몰운대 [沒雲臺]에서 / 이 인평
이 깎아지른 벼랑 끝에 이르러
내 삶은 끝인가 시작인가
아래만 보고 걸어왔는데도
허리를 굽혀 절벽의 하방을 내려다보니
헛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온 지난날들이
오히려 아찔하다
불혹을 지나 지천명에 다다른 세월은
오름인가 내림인가
낭떠러지 밑으로 꿈처럼 흘러가는 한 줄기 물살이
절벽을 타고 솟구치는 바람이 되어
어리석은 육신을 잡아끄는 순간
현기증 도는 세상에서 오금이 저린 나는 어느새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자란
옹골진 소나무의 뿌리를 붙들고 있다
아득한 절벽 위에서
한 조각구름이 솔바람을 쓸어가듯
가파른 화암의 벼랑 사이를 지나온 내 삶의 여정은
이곳에 이르러 끝인가 시작인가
해거름에, 고요의 여운을 쓸어오는 물소리가
내 오랜 갈증의 혀를 적신다.


몰운대 [沒雲臺] 건너편에 있는 정자 / 몰운대와 정자 사이 역시 가파른 낭떠러지라서 가까이 내려다보질 못했다.

간신히 팔을 뻗어 찍은 낭떠러지 사진 /
수평의 원근은 어찌어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파른 수직의 원근을 표현하려면 담대한 가슴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본다. 수백 명이 쉴 수 있는 광활한 반석의 일부가 보인다...

500년 된 소나무와 몰운대 [沒雲臺] 석면에 새긴 120년 전 정선군수 지군 오 횡묵의 이름
몰운의 높은 대가 반천에 솟았는데
지팡이 날려 올라가니 풍연을 벗어났네
굽어보니 굽이진 비탈은 강물에 다 달아 다하였고
돌아보니 우뚝한 바위 끝은 북두에 매달렸네
이 땅에 사는 사람 세속을 떠났으니
이번에 온 태수는 신선이 된 듯하네
이름 남겨 劉郞 [유랑]에게 부탁하는데
그래도 碑 [비]에 비하면 나은 것 같다
1888년 5월 10일 / 지군 오 횡묵
* 오 횡묵은 1887년 3월 정선군수로 부임하여 1888년 8월 이임하기까지 1년 5개월간 정선군수를 지냈으며, 고종 24년인 1888년 5월 10일 집강 유 종택의 안내로 몰운대 [沒雲臺]를 돌아본 후 지은 한시로 정선총쇄록에서 발췌한 시

몰운대 [沒雲臺] 반석 위의 500넘은 소나무를 보좌하고 있는 노송 3 형제

* 2010년 9월 29일 몰운대 [沒雲臺]에서 *
'여행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원 영월)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0) | 2023.01.05 |
|---|---|
| (강원 영월) 가을 새벽이슬에 촉촉히 젖은 산이실 전원마을 (0) | 2023.01.05 |
| 인천대공원 2009.6.10 (0) | 2023.01.01 |
| 삼천포 大橋 (0) | 2022.12.30 |
| 채석강,내소사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