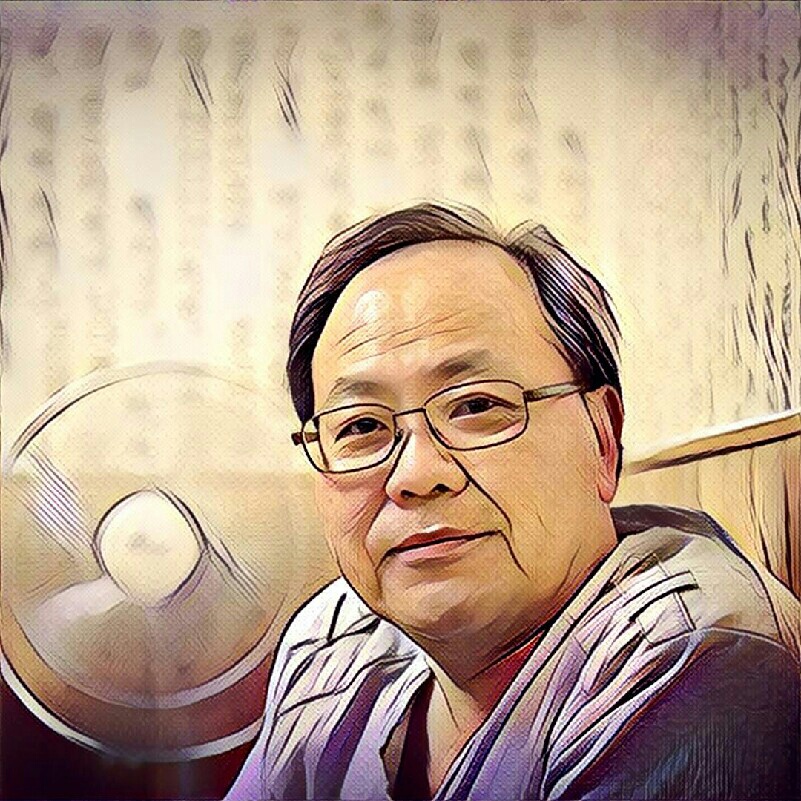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 male base vocal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1mm 치과
- blues&jazz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60bpm
- 황우창
- 티스토리챌린지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추억의도시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익숙해질 때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y.c.s.정모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오블완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碑巖寺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그래,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본문
그래!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수 천 년 전 조그만 섬에 사람이 살았다. 신석기시대에 살았던 그네들의 흔적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길을 옮긴다. 호젓한 오솔길 옆! 잿빛 소나무 담장 거미줄 위에 한 줄기 햇살이 포근히 얹혀 있다. 담장 너머 조그만 연못가에서 휘릿휘릿 잠자리 떼 노니는데, 쌍으로 날아다니는 모습도 익숙하고, 수면 위에서 가쁜 숨을 내쉬는 날갯짓도 정겹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치를 맴도는 방아깨비와 잿빛 메뚜기의 푸득임이 재밌다. 메뚜기는 녹색이어야지 저리 잿빛은 왠지 싫은데.. 그나마 동무 하자 살랑거리는 모습에 살포시 마음이 열린다.
저 멀리 바닷 소나무 가지가 출렁거린다. 나무 꼭대기에 백로 한 마리 쉬자커니 날아 앉은 자태가 우아하고 맑고 파란 하늘색에 어우러진 흰빛이 더욱 투명하여 가을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까지 청량하다. 연못 저쪽에 해오라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오라 날갯짓하는 듯하여 조금 더 다가가려 풀숲으로 들어서는데, 스르륵 풀잎이 앞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 조그만 뱀 하나 입맛 다시며 물가로 달려간다.
"그렇구나! 나를 부르는 게 아닌가 보구나!"
정수리를 달구던 따가운 햇살의 기운이 수그러들기 무섭게 이파리 넓은 나무에는 어느새 단풍이 들어가고 있다. 그악스럽던 여름은 가고 조석으로 선뜻하니 찬바람이 분다. 찬바람 불거든 술 한잔 하자던 처사촌 오빠는 이 여름 막바지에 속절없이 가버렸다. 가을은 그렇게 생채기 하나 그어놓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가을 해는 꼬리를 빨리 감추는데.. 여섯 시가 넘자 어스름 그늘이 연못가로 찾아든다. 잿빛 소나무 담장 옆 풀잎 위에 잠자리 한 마리 졸고 있다. 저 녀석은 아까 짝짓기 하던 놈인데.. 제 짝은 어쩌고 저리 홀로 졸고 있을까?
잠자리 날개에 투명한 가을이 얹혀 있다. 홀연히 가을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눈앞에 보이는 풍경 속에 내가 들어선 것을 보니 지금 나는 가을을 타는 모양이다. 그리 등 떠밀며 가라던 여름은 이제야 가고, 뜬금없는 생채기 하나 잠자리 날개에 얹어 쉰일곱 번째 나의 가을이 사부작 다가왔다."
"그래!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2013. 9. 9
삼목도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이가 들긴 들었어도 (1) | 2022.12.08 |
|---|---|
| 지금 같은 세상에 (0) | 2022.12.08 |
| 약 뿌리는 날 (0) | 2022.12.08 |
| 우 연 (0) | 2022.12.08 |
| 코니와 함께할 날들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