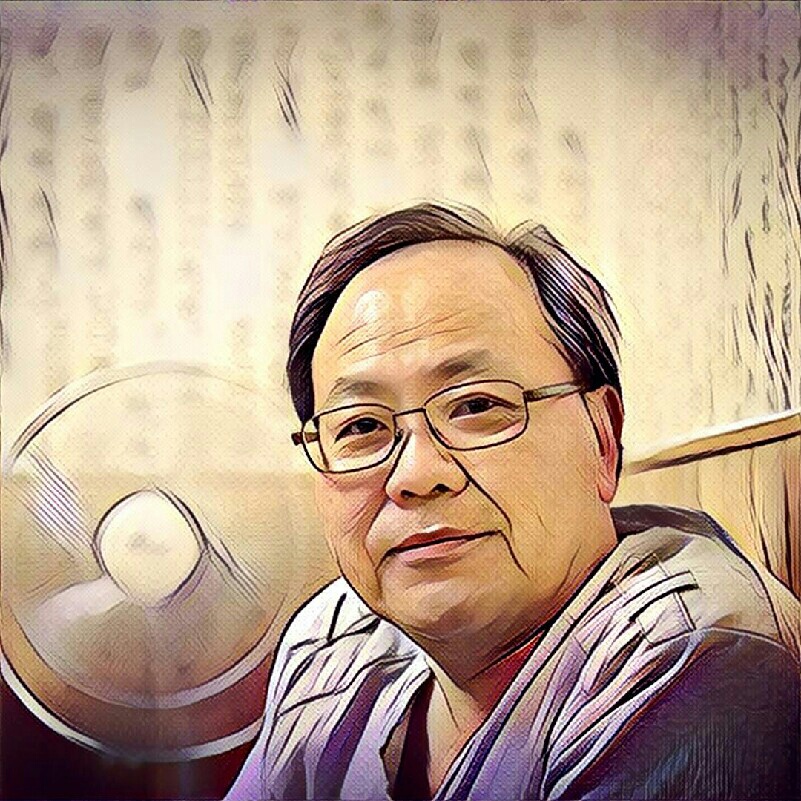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1mm 치과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티스토리챌린지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60bpm
- 익숙해질 때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碑巖寺
- 이어령#눈물한방울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y.c.s.정모
- male base vocal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추억의도시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황우창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오블완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조선 시대의 대중언론 본문
조선 시대의 대중언론
대자보와 비슷한 조선 시대의 민중언론
1980년대에 대학가를 가본 사람은 건물벽, 게시판, 실 지어 길바닥까지 덕지덕지 붙은 대자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사전검열을 통해 정권의 통제를 받던 시절, 대자보는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거의 유일한 대중언론이었다.대자보는 1960년대 말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홍위병을 통해 종이에다 큰 글자로 4대 원로의 잘못을 고발하게끔 한 데서 유래되었다.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는 표현의 주체가 드러나지만 대자보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이고 비밀스러운 표현 방법이었다. 누구든 써붙일 수 있고, 일단 대자보가 붙으면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 나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 군사정권에 의해 언로가 막힌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 대자보와 비슷한 민중언론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이른바 괘서(掛書)라고 부르는 것인데, 민심이 흉흉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발표자의 이름을 숨긴다는 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포악한 관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는 점, 관리들이나 포졸들에 의해 발견 즉시 떼어졌다는 점 등은 1980년대의 대자보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괘서에는 누명을 씌우는 무고가 많았고, 권력투쟁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잦았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패서사건은 1547년(명종 2년)에 일어난 양재역 패서사건이다. 부제학 정언각(鄭彥毅)이 선전관 이노와 함께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느라 남쪽으로 갔다가 전라도 양재역에서 붉은 글씨로 붙어 있는 패서를 보고 가져와 임금에게 바쳤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그믐날."
여기서 여주는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를 가리킨 것이다.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가 첫 아들 인종을 낳고, 제2계비 문정왕후 윤씨가 둘째 아들 명종을 낳았는데, 중종이 죽은 후 인종이 즉위하지만 병약해 즉위 8개월 만에 죽는다. 그 뒤를 이어 명종이 즉위하지만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였다.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가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형과 함께 국정을 잡고 는 1545년 을사사화를 일으켜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괘서에서 언급한 이기라는 자는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주범이다. 이 괘서는 당시의 이런 상황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윤원형 일파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했다. 이런 쾌서가 나도는 것은 아직도 불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을사사화 때 미처 쫓아 내거나 죽이지 못한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해 버렸다. 이것이 정미사화이다. 당시 사람들은 윤원형과 이기를 이홉 이라 했고, 괘서를 가져온 정언각과 정순봉, 임백령 등을 합쳐 삼간이라고 불렀다.
양재역 괘서사건은 이처럼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대도 임꺽정 사건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훈민정음과 한글 괘서 출현
괘서는 주로 한문으로 된 것이 많았지만 한글 괘서도 차츰 많아졌다. 한글 괘서는 1449년에 처음 나타났다. 1445년에 한글 최초의 문학작품인 <용비어천가>가 완성 되고, <훈민정음>을 펴낸 것이 1446년이니 채 3년도 안 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뜻이 금방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괘서는 주로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수령들을 고발하는 데 이용되었고, 간혹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양반들이 일부러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괘서 는 조선 중기 이후 더 자주 나타난다. 그만큼 국정이 혼란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조선 정부는 법으로 괘서 를 엄격히 금지했다. 괘서를 쓴 자는 발각되면 목 졸라 죽이는 교형에 처했고, 괘서를 본 사람은 즉시 소각해야 했다. 소각하지 않고 관가에 내놓으면 곤장 80대를 맞았고, 또 관리가 이를 수리하면 곤장 1백 대를 맞았다. 괘서사건이 날로 빈번해지자 영조는 괘서를 쓴 범인을 잡으면 2 품 벼슬과 천금을 내리겠다고 고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괘서는 사라지지 않고 한말까지 계속되면서 한편으로는 민중언론의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억울함을 구제하는 국가 공식제도로 신문고등의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괘서는 조선 시대의 유일한 민중언론이었다.
# 출처 : 상상밖의 역사 우리 풍속 엿보기 / 김경훈
'철학,배움,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간 이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0) | 2025.02.03 |
|---|---|
| 묵매(墨梅) (0) | 2025.02.02 |
| 덕이 있는 사람 (0) | 2024.11.04 |
| 왜색 지명 (1) | 2024.10.20 |
| 저녁 별의 속삭임: 하루의 마무리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