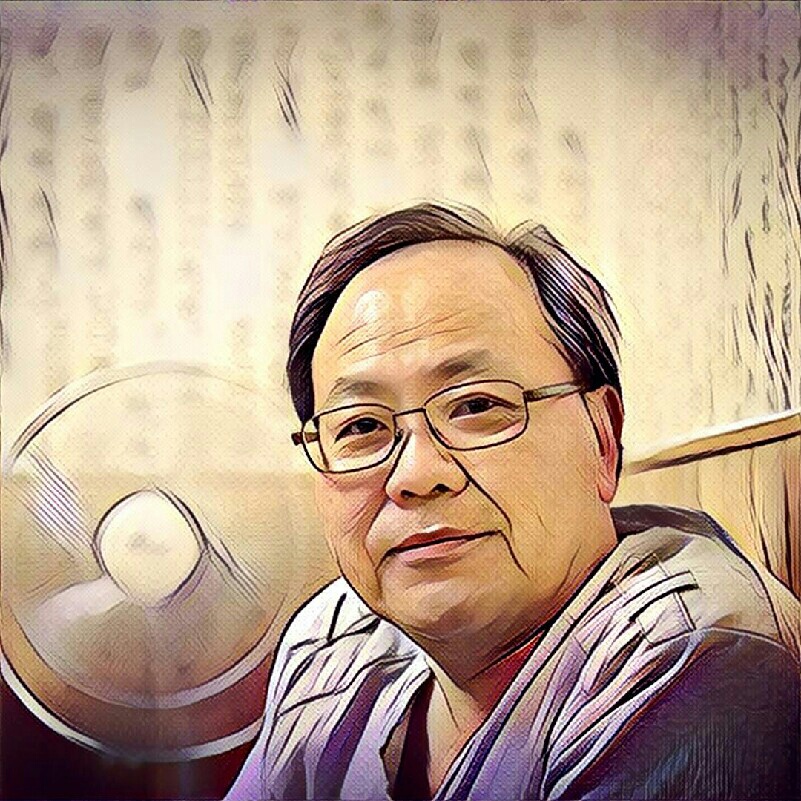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익숙해질 때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오블완
- 황우창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male base vocal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blues&jazz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male vocal
- 碑巖寺
- 티스토리챌린지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y.c.s.정모
- 60bpm
- 1mm 치과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추억의도시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한 마리 나비 되어 본문
한 마리 나비 되어
엄청난 비가 너른 영종 벌판을 덮어 버릴 듯 쏟아지던 날이다. 사무실 창문을 부르르 울리는 천둥소리와,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릴 듯이 무섭게 번쩍이는 번개가 마음을 심란하게 하던 차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첫마디부터 뜬금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20년 만에 듣는 친구의 이름을 대며 오늘이 그 친구의 발인이라 전한다. 순간 가슴이 턱 막히며 그 의 모습이 스치듯 떠오르다 사라진다.
한 친구가 있었다.
성격이 시원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항상 소년과 같은 미소를 짓던 친구였다. 그는 자신의 아명[兒名]과 같이 유성처럼 어느 날 한 순간,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 버렸다.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았을 터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오십여 년 알토란 같은 삶을 누리던 이 세상에서의 인연과 부지불식간에 손을 놓았다.
그를 처음 만난 곳은 그의 집이자 우리 집이다. 중학교 3학년 초에 인천으로 이사 온 우리 여섯 식구가 그 친구네 집에 셋방을 얻어 이사를 하였다. 이삿짐을 부리던 중 마주친 희멀건 그의 얼굴은 귀티가 흘렀으며 체격도 큼직하니 나보다 두 어살 위인 듯 보였으나 그 친구 어머니께서 동갑내기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줄 알 정도였다. 그 시절이면 자기 집에 세 들어 사는 나에게 텃세 정도는 부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친구들까지 소개해주는 의젓한 친절을 베풀어 주던 그였다.
중학시절 남은 1년간은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관계로 한 집에 살았다는 기분을 못 느끼며 지냈는데, 형편이 좀 나아진 이듬해에 마당이 꽤 넓고 라일락 향기가 짙게 흐르는 근처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과 셋방살이하는 종주의 관계를 청산하며 동네 친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새로 시작한 성서 교리반에 함께 등록을 하게 된 계기로 혼자 다니기는 조금 먼 듯한 길을 함께 걸으며 우정을 다지게 되었고, Y.C.S. 선배들의 군기잡기에 반항하며 서로의 뜻을 합쳐가던 중 성가대 생활까지 함께한 연유로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입영통지를 받아 들고 그는 최전방 G.O.P.로, 나는 후방 교육 사단에서의 군 복무생활 이후, 내가 먼저 결혼을 하며 그 동네를 떠나면서 그와의 만남도 뜨악해졌다.
몇 년 뒤! 노 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온 세상천지에 노동조합의 물결이 노도처럼 휘 몰아 칠 즈음, 때 마침 勞政업무를 담당하던 내게 그는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러 방문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신분으로 다가와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주 강한 성향으로 노조를 이끌던 그는 이미 놀랄 만큼 성품이 변하여 내가 알던 예전의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勞와政의 관계에서 오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원치 않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다.
외골수적인 그의 노동조합운영 방식에 회의를 느낀 조합원들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치른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이후 나는 진급과 동시에 섬으로 발령받아 골치 아픈 업무에서 벗어나 잠시 한량한 세월을 보낸 뒤 다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업무 전선에 복귀하여 여러 직을 전전하다 사직한 이후 지금까지 20 년간 그를 잊고 지냈다.
소식을 전하던 친구는 그와 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 일부러 장지에서 그를 보내고 그의 죽음에 대한 통보를 하며 연실 미안함을 토로하는지라 일단 그 친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찌 된 사연인가를 물어보았다. 이윽고 긴 한숨을 쉬며 저 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데 사고라기에는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여 혼자 새기리라 다짐하고 그냥 가슴속에 묻고 말았다.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하늘의 뜻과 지신의 삶이 어긋날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약함을 느끼게 된다. 운명이라는 게 있으면 운명을 따를 것이고 윤회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를 따라야 할 것이다. 어느 한순간의 부주의와 실수가 많은 사람의 삶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을 되풀이하며 저지르는 우매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내 인생의 한 자리에서 서로 즐거움과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던 친구의 죽음이 서럽고, 새삼 삶의 헛헛함이 느껴진다. 친구의 떠남도 보지 못한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 한치 양보 없이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던 젊은 날의 덕 없고 고지식한 나의 잘못을 빌며 이제 한 마리 나비 되어 떠난 그의 영원한 잠 속에 친구의 사랑을 실어 보낸다.
2009년 7월 30
'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포동의 경양식집들 (1) | 2022.11.28 |
|---|---|
| ⿓ 遊 回 想 (용유회상) (1) | 2022.11.28 |
| -酒- 노 & 문 & bottom line (1) | 2022.11.28 |
| 도화동 성가대의 추억 (0) | 2022.11.27 |
| 글을 쓴다는 것 (0) | 202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