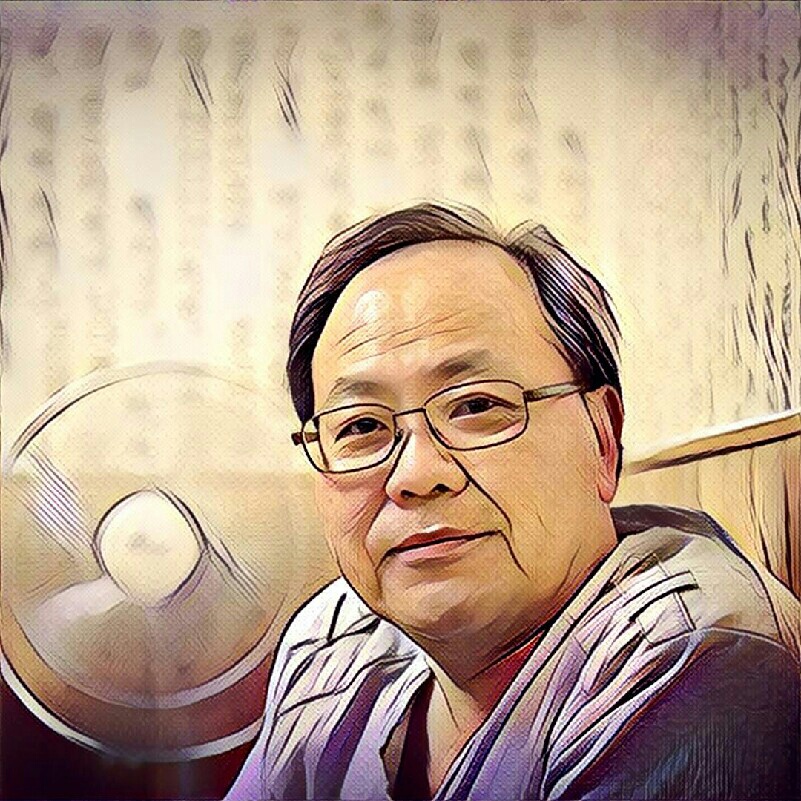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선후배정모#전가복#MBC#우연이#큰애#석민#튤립5송이#
- Bottomline #40주년 #인천최초 #jazz #club #버텀라인 #매주 #토요일 #공연 #Incheon #개항장 #로컬 #노포 #인천멋집 #인천맛집 #개항로 #인천여행 #인천데이트 #백년가게 #인천광역시 #인천음악창작소
- #이상준#석선녀#용유출장소#재무계#건축과#신설동#선녀바위#꽃게#용유#최현미
- 부천중동 황소갈비#설빙#이자카야 생마차#두열이 부부#윤석이부부#허석이 부부#형과니부부
- 학교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졸업
- 김활란개인공원"망우리
- #세계사 #225쪽 #마음글방 #최동호해설 김달진역주
- 하얀뚝닭곰탕
- 개항장야행
- #寒山詩 80 #한산시80
- 추억의반추#나이듦#어머니#아버지#유동석#이기경#장정석#조광진#그리고 그 이름들..
- 꼬챙이#꼬기배
- 황철현#꾸지뽕삼계탕#카페포조#우현갤러리#빈티지뮤직카페#찬송교회#이영경#스피커메이커#우현로90번길19-11#01038150679#동인천
- 닭곰탱이신포점#맛있는꿈#이정숙
- 김유풍#한광덕#공종학#김현관
- 꾸지뽕삼계탕
- 무릉계곡#김금복#미천골#김석민#김현관
- 김병종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스무살 #라틴화첩기행 #Veinte años #Maria Teresa Vera
- 하얀닭곰탕칼국수
- September #김창기 #Earth Wind & Fire #노래가 필요한 날
- 이병철#고진옥#김용호#오일근#???
- #휴양지의 음악 #코파카바나 #배리 매닐로우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황우창#세상의끝에서만난내인생의노래들
- 신경섭가옥#신씨고택#마르셀프루스트#곡교천#예당저수지#광시한우촌#길가식당#광진이
- 유태식과종성이
- 수창이#한영대#우성훈#성용원#조봉환#카페쟌피#마루카페
- #수창이#농업방송인터뷰색다르고남다른사진디자인강의#사진디자인 #백구진주 #송월동동화마을#화안카페#파리바게트
- 초계모밀소바
- 동석형기일#6월26일
- 벽제승화원#기수형#파주광탄#서현공원#인천승화원#인천가족공원#별빛당#어머니#39호#수창이#6호 #만월당#기경이#60호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시간의 굴레 본문

서울 도심에서 화재 감시와 오정을 울리던 중부소방서 망루.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앞에 있었으며 1976년 철거됐다. 1958년 [임인식 제공]
시간의 굴레
시계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일이 있다. 국민학교 2학년이던 해(1946) 늦가을이었다. 오후반이던 우리는 공부가 끝나, 책상에 걸상을 올려놓고 반장의 ‘경례’ 구령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바로 이때 앞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그날 결석했던 아이가 들어섰다. 녀석은 “왜 이제 오느냐”는 선생님 말씀에 벌레 씹은 얼굴을 한 채,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오정이 안 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물론, 우리도 “와”하고 웃었다.
집에 시계가 없던 그는, 오후반이 되면 언제나 ‘오정(午正) 부는 소리'에 맞추어 점심을 먹고 학교에 오곤 하였는데 그날 따라 오정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날이 잔뜩 흐려서 해가 어디쯤 떴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던지라, 이 젠가저 젠가 마음만 졸이다가 아무래도 아니 되겠다 싶어 제 딴에는 허겁지겁 달려왔던 모양이었다.
오정 사이렌에 맞추는 시계
당시 시계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서울 중류층이던 우리집에도 마루 기둥에 걸린 괘종시계 하나뿐이었다(공무원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차셨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동네에도 시계 있는 집이 적어서 우리 집으로 시간을 물으러 오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이어서 서울 시민의 대부분은 광화문 소방서(현재 코리아나 호텔 건너편)에서 매일 정오에 울리던 사이렌 소리로 낮시간을 짐작하였다. 이를 “오정 분다” 일렀고, “오정이 불려면 아직 멀었다”, “오정 불고 한참 지났다”, “오정 때가 되었다” 하는 말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본디 이 사이렌은 2차 대전 때 일제가 미군기의 공습에 대비코자 마련한 것이었으나 조국 독립 뒤부터 한동안은 정오를 알리는 시계 구실을 맡았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 학교 오후반 어린이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이제 점심 먹고 학교에 가야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고 놀러 나가서 ‘오정이 분 뒤에도 들어오지 않는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개야 오정 불었으니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외치며 골목을 찾아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였던 만큼 앞의 우리 반 친구가‘오정 불기를 기다리다가 지각을 하고 만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한편, 그때의 ‘오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방서 망루에서 1분 동안 계속 울린 사이렌은 사람이 기계를 돌려야 하는 수동식이었다. 따라서 서너 바퀴를 돌린 뒤에라야 제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 돌리기를 멈춘 뒤에는 꼬리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소리가 퍼져 나가는 데에도 얼마간의 동안이 걸리므로 광화문 일대의 정오와 동대문이나 마포 일대의 정오는 차이가있게 마련이었다. 더구나 서대문 소방서(지금의 경찰청 자리)에서도 가끔 울리던 정오 사이렌이 광화문 소방서의 소리와 맞아떨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오히려 한쪽 소리가 다른 쪽의 뒤를 길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사였고 한쪽이 거의 죽어갈 무렵에 다른 쪽에서 갑자기 생각난 듯 울기도 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의 거리 풍경이다. 이 ‘오정’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손목 시계 주인공들은 걸음을 멈추고 시곗바늘을 바로잡았다. 당시 시계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소방서의 사이렌은 '공인된 시간'이었으므로 시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의 모든 시계는 반드시 하루 한 번 '밥'을 주어야 하는 태엽식이었으므로 이때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전에는 해의 움직임을 이용한 해시계나 물의 흐름을 본뜬 물시계 그리고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을 재는 모래시계 따위로 시간을 가늠하였다. 삼국 시대 초기에는 일자(日者) 또는 일관(日官)이 있어 시간을 알렸고 통일 신라 때(718)에는 누각(漏刻)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박사 6명과 직원 1명을 두었다. 이보다 이른 시기(554)에 백제의 역 박사(曆博士)가 일본에 건너갔으며 이들이 660년에 물시계를, 그리고 675년에 천문대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7세기 이전에는 해시계나 물시계가 널리 퍼져 있었다.
또 신라 혜공왕(756~780) 때에는 12만 근의 구리로 종을 만들어 시간을 알렸으며 그 소리가 10리 너머까지 퍼져 나갔다고한다. 이 같은 종은 고려 때(충목왕)에도 만들었다.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는 1395년(태조 4), 전각에 큰 종을 걸어두고 새벽과 저녁에 치도록 하였다. 1414년에 이르러 오경(五更)초에 64번 치던 파루(罷漏)를 오경 석점(三點)에 28번 치도록 고치는 동시에 통금을 알리는 인정(人)은 폐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종로 네거리의 보신각 종을 인정 때에 28번, 파루 때에 33번을 쳤다. 앞의 28번은 28수(宿)를, 33번은 33천(天)을 본뜬 것이다.
지금의 50대들은 어렸을 때 '잉경 뗑경 가다머리 속병’이라는노래를 불렀다. ‘가다머리’는 ‘뭉치'라는 뜻의 일본어 가다마리(仁)'에서 나온 말인 듯한데 이 노랫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잉경’은 ‘인정’이 바뀐 것이다. 또 60대 이전 사람들은 숨바꼭질할 때 '잉경 떼엥 바라 떼엥 잉경 전에 고쿠마리 떠었다’는 노래로써 눈을 가린 술래가 숨은 동무를 찾기 시작하는 신호로 삼았다. 이훈종 선생에 따르면 '바라'는 파루에서 왔고 고쿠마리는 당시 종 치는 군사를 감독하던 군관의 전립(戰笠) 꼭지에 달렸던 백로 깃털이라고 한다. 어린이들 눈에도 모자와 털이 그럴듯 하게 보여서 이 노래가 나왔을 것이다.
보신각 종은 궁중에 있던 누국(漏局)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울렸다. 이곳에서는 물이 흐르는 양에 따라 밤 사이의 시간을 북과 징으로 알렸고 보신각 외의 각 순포막(巡捕幕)에서도 이를 받아 자기네 막에 걸린 징이나 북을 쳤다.
예전에는 하루 24시간을 12시간, 곧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로 나누었다. 따라서 '오정’은 오시(午時)의 복판이라는 뜻이고 '자정'은 자시(子時)의 가운데라는 뜻이다. 그리고 밤 시간은 따로 초경(初更), 이경, 삼경, 사경,오경이라 불렀다. 삼경(11시~1시)이면 깊은 밤이고 오경이면 먼동이 트는 5시 무렵이다.
한편, 1경을 다시 6으로 나누고 20분씩을 점(點)이라 하였으며그때마다 징을 치고 시각이 바뀌는 11시 · 1시 · 3시에 북을 울렸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밤 사이에 북이 세 차례 울리고 그 사이20분마다 징소리가 퍼져 나간 셈이다. 내 어릴 적에 할아버님이 친구분과 약속 시간을 정하실 때 ‘오후 몇 시’라 않으시고 몇 점'이라는 말을 쓰신 일이 떠오른다. 20분 단위를 가리키던 ‘점’이 뒤에 시간의 하나 치로 바뀌었던 듯싶다. 이 말도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조 말에 이르러 시간을 알리는 종의 구실을 대포가 맡았다.1884년(고종 21)부터 창덕궁 금천교에서 누국의 물시계에 따라 정오에 대포 한 방을 공포로 쏘아 올린 것이다. 장안 사람들은 이를 ‘오포(午砲)’라 불렀다. 뒤에는 소리가 더욱 잘 들리라고 남산(예전의 국립 도서관 자리)과 효창동에도 오포 부대를 배치, 두 곳에서도 포를 놓았는데 이것은 1922년 8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여유로 시간에 관대했던 코리안 타임
오포가 폐지된 것은 1921년 위싱턴에서 열렸던 군축 회의의 여파로서, 일제가 군비를 줄인다는 시늉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설이있다. 오포를 놓는 데에는 매일 화약값 4원 외에 포수 2명의 보수를 합하여 한 해 2,000원에서 3,000원이 들었다고 하니 비용 또한 적지 않았던 셈이다. 1923년 1월 1일 남대문역이 지금의 서울역으로 옮겨가면서 정면에 큰 시계를 달아, 시민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서울역 시계'는 1950년대 이후부터 '만남의 장소'로서 큰 구실을 하였다. 기차 여행객들은 흔히 '서울역 시계탑 아래'를 약속 장소로 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계가 걸린 곳은 탑이 아니라 벽이었음에도 누구나 '탑아래'라 일렀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한때 '코리안 타임'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린 적이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네 부정확한 시간 관념을 꼬집은 말이다. 1960년대까지도 우리는 흔히 약속을 할 때, 이를테면 ‘두시’를 '한두어 시쯤’이라 하고 '두시 반'은 으레 '두시 반쯤’이라 얼버무렸다. 그리고 이 ‘쯤’에는 30여 분의 여유가 있어서 '두시 반 약속'인 경우세 시까지 대어 가는 것이 보통이었고 상대방도 으레 그러려니 여겼다. 공중의 모임이나 관청의 집회 따위도 이와 같아서 10시 행사는 10시 반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도 그렇게 알고 모였다. 따라서 반드시 10시에 열어야 할 행사는 9시 반으로 알렸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간 엄수'라는 꼬리까지 붙였다. 이 30분 에누리의 관행은 외국인과의 약속에도 타성적으로 적용되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우리네 시간 관념이 이처럼 무디었던 것은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농경민족이어서 4계절을 시간의 단위로 삼아 왔던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또 동양 사회는 시간에 대해 매우 대범한 편이었다. 우리나 중국 · 일본의 경우 크게는 60년을 하나치로 삼는 60 갑자(甲子)를, 작게는 12년을 주기로 삼는 간지로 시간을 셈하였다. 이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연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갑자만을 쓴 건물의 상량문으로는 60년에서 120년까지의 오차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이다. 또 예전에는 나이도 간지를 나타내는 동물로 따졌다. 이와 같은 관습은 몽골과 티베트 그리고 네팔에도 퍼져 있었다.
1953년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 올랐던 텐징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범띠이므로 아마도 1914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다음의 범띠 (1926년)라면 지나치게 젊고 그 앞이라면 영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 하였다. 어찌 텐징뿐이겠는가. 우리 옛 분네 가운데에도 자신의 정확한 생년을 몰랐던 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양적(?) 인생관 때문에 정두원(1581~?)이 북경에서 자명종을 얻어 왔으나 흐지부지되었고 1666년 자명종의 이치를 본뜬 혼천의(渾天儀)가 나왔지만 역시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무관심은 근래에까지 이어져서 '오정 사이렌’이나 '코리안 타임'을 낳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제, 초는커녕 초의 몇십 분의 일까지 따지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일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 광언의 민속지
'철학,배움,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신은 늙어도 꿈은 늙는 것이 아니다. (0) | 2023.07.09 |
|---|---|
| 꿈에서 얻은 지혜 <구운몽> (0) | 2023.07.09 |
|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의 鑑戒(감계) (0) | 2023.06.30 |
| 월명성희(月明星稀) - 달이 밝으면 별빛은 흐려진다. (0) | 2023.05.19 |
| 君子固窮 (군자고궁) (1)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