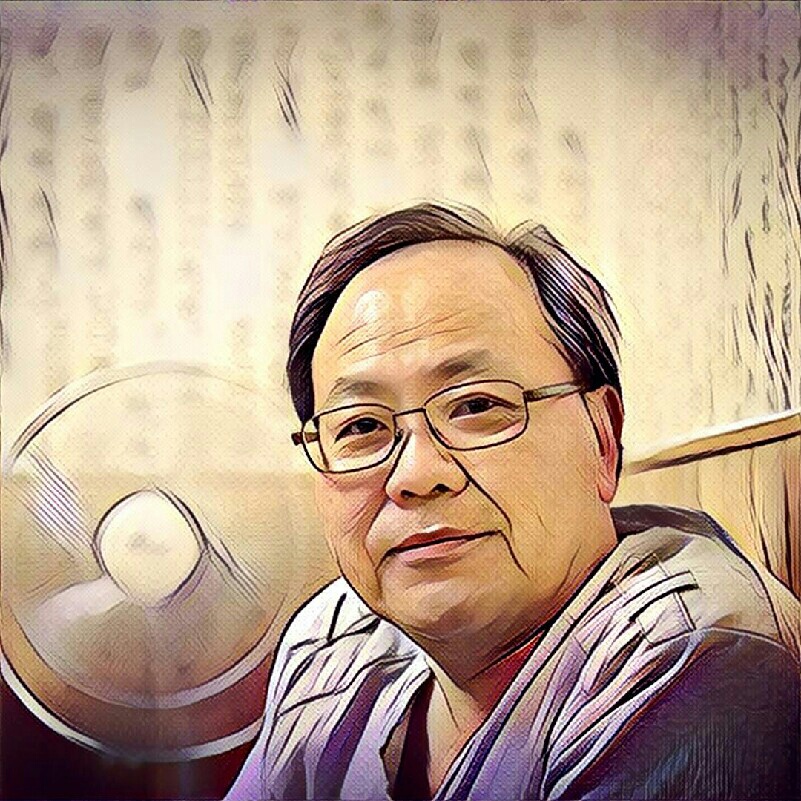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60bpm
- 황우창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티스토리챌린지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male base vocal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y.c.s.정모
- blues&jazz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碑巖寺
- 1mm 치과
- male vocal
- 익숙해질 때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추억의도시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오블완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왜 소동파는 묵육(墨肉)을 말했을까 본문
왜 소동파는 묵육(墨肉)을 말했을까
知識 ,知慧 ,生活/같이공감할 수 있는곳

이영준 작가 작품 乘風破浪 승풍파랑,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왜 소동파는 묵육(墨肉)을 말했을까
빈섬 이상국
서양의 펜과 연필을 비롯한 각종 필기구들과, 이 땅의 붓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가 씌어지는 부분이 뾰족하고 딱딱한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것인가의 차이다. 펜과 만년필은 펜촉의 갈라진 틈을 이용하여 잉크를 조금씩 내고, 볼펜은 심에 구르는 것을 달아 그것을 밀어가며 잉크를 등사하듯 찍어내고, 연필은 흑연 심 자체가 조금씩 마모되면서 종이에 자취를 남긴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뾰족하고 딱딱한 심의 끝을 이용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다. 물론 서양에도 그림을 그릴 때 활용한 붓이 있었다. 이때의 붓은 색채가 있는 면(面)을 만들어내는데 효율적인 도구였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거의 유일한 필기구는 붓이었다. 글씨를 쓰는 일은 붓을 이해하는 일이었고 붓이 지닌 모든 특징을 무의식 속에 담는 일이었다. 오로지 붓에 집중되었기에, 그것은 동아시아 문화 전체의 영혼 같은 것이 되었다.
추사는 좋은 벼루와 좋은 먹, 그리고 좋은 종이가 명필(名筆)을 만드는 필수라고 힘주어 주장했지만, 그래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명연(名硯)이나 명묵(名墨), 명지(名紙)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직 명필이다. 지필묵이 다 중요하지만 정녕 한 인격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붓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묘한 것은, 글씨에는 붓이 없다는 점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글씨를 쓰고 나면 붓은 퇴장한다. 남는 것은 먹과 종이다. 먹과 종이가 글씨를 남긴다. 그러나 먹과 종이만 있었다면 결코 글씨가 될 수는 없었으리라.
거기엔 중요한 다섯 가지가 더 필요하다. 첫째는 글을 쓰는 사람이며, 둘째는 벼루이며 세 째는 먹이며 네 째는 붓이다. 그리고 흔히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매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물이다. 먹은 물을 머금어야 한다. 벼루는 마른 먹을 갉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을 적셔, 젖은 먹 즉 먹물을 만들어낸다. 붓은 물기를 머금은 먹이라야 찍어 쓸 수 있다. 종이 위에 씌어 진 글씨는 먹만 남기고 물기는 내보낸다. 물은 먹을 종이 위에 옮기고는 가만히 퇴장하는 글씨의 숨은 공신이다. 또한 물은 붓의 터럭들을 모으고 움직이게 하고 종이 지면의 저항들과 직접 싸우고 어르는 최전선의 전사(戰士)이기도 하다. 글씨에는 전혀 물이 없지만, 물이 없었다면 저 글씨들은 나올 수 없었다. 글씨를 쓰는 일은 저 '숨어있는 물'의 특성과 움직임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일이기도 했다. 글씨를 쓰는 동안에만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휘발하는 물의 은덕(隱德)에 고개 숙이지 않는 자라면, 모름지기 고수라 할 수 없다.
딱딱한 심을 가진 서양필기구와, 딱딱한 자루를 가졌되 끝은 모질(毛質)로 이뤄진 동양필기구는, 글씨에 대한 열정과 함의를 다르게 만들었다. 서양필기구는 글씨의 형태와 구성을 다스리기가 붓보다 훨씬 쉽다. 딱딱한 심과 글 쓰는 사람의 힘이 만나서 글씨를 이룬다. 쓰려고 하는 의지가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런데 딱딱한 자루와 종이 사이에 '부드러운 털'이 끼어있는 동양의 글씨 쓰기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초보는 자기가 의지한 대로 전혀 쓸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 붓털의 특징을 이해하고 체득해야 붓끝을 조절하고 그것이 움직여 글씨를 만들어내는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 서양필기구는 종이의 저항이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붓은 지질(紙質)이 붓끝과 싸운다. 접(接)의 미학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다. 붓끝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솔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수련과 연마를 거치면, 서양필기구가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다채롭고 풍부한 질감의 글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쓰는 일이 어렵기에 그 속에는 깊이 있는 미학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돌올하는 개성적인 경지를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붓글씨는 그냥 서(書)에 머무르지 않고 서예(書藝)로 나아간 것이다.
이제 소동파가 말한 글씨의 다섯 가지 층위를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동강 조수호선생이 동파의 신기골육혈(神氣骨肉血)과 저수량의 추획사(錐劃沙)를 멋지게 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접(接)'론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하게 석명(釋明)하지 못해 뭔가 감질 나는 기분이 있다. 소동파가 글씨를 인간의 몸과 정신을 구성하는 것들과 유비(類比)를 하고 있는 까닭은, 서인일체(書人一體)라는 전통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글씨는 곧 사람이다.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피를 가졌듯 글씨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그 정신과 기운과 뼈와 살과 피는, 아무 글씨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붓끝에서나 나오는 것도 아니다. 글씨 쓰는 사람과 글씨가 같아지는 경지라야, 신기골육혈이 동한다. 신기골육혈이 동하는, 살아있는 글씨라야, 바로 그것을 쓴 사람이라 할 만하다. 글씨를 살아있게 하라. 이것이 소동파의 명제다. 어떻게 글씨를 살아있게 하는가. 동파는 그 비밀을 저 신기골육혈에 숨겨놓았다.
태초에 사람이 있다. 그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다. 그가 종이를 앞에 놓고 생각에 잠긴 채 먹을 갈고 있다. 그는 봉안(鳳眼)을 감았다 뜨며 침묵의 입술을 가만히 혀로 축인다. 그가 붓을 쥐고 먹을 찍는다. 동파가 말하는 묵(墨)의 신(神)은 바로 이것이다. 귀신이 아니라, 글씨를 쓰는 인간의 보편적 정신. 이제 이 정신은 붓을 통해 종이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글씨를 쓰는 인격이며 그가 닦아온 내공이다. 먹을 옮기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붓이었고 보다 근원적인 것은 물이었다고 말한 걸 기억하리라. 먹을 옮기기 이전에, 바로 이 인간의 정신을 옮긴다. 이 정신을 옮기는 것은 '숨은 물'처럼 묘용(妙用)하는, 한 삶의 깊이 있는 풍격(風格)과 고난의 수련을 통한 내공이다. 그것은 글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글씨에 표면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묵기(墨氣)는 이제 그 사람이 쥔 붓에서 일어나는 기운이다. 붓은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먹의 특질과 종이의 특질을 살펴야 한다. 좋은 글씨를 이루는 데는 먹과 종이라는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묵신이 묵기로 나아가는 일은, 보편적인 덕(德)과 기(技)가 드디어 발휘될 시점에 이르러,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묵신에서는 글씨를 쓰는 보편적인 자아가 등장하지만 묵기에 이르면 이제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한 사람의 구체적인 긴장과 집중과 흐름이 생겨나 있다. 필가묵무(筆歌墨舞), 붓은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먹은 춤추기 시작한다.
신(神)과 기(氣) 두 글자는 글씨 쓰는 사람의 문제이다. 다시 중요한 명제를 생각하자. 글씨는 곧 사람이다. 뒤집으면 사람은 곧 글씨다. 이제 사람이 글씨로 나아간다. 사람이 글씨가 된다. 사람과 글씨를 잇는 핵심적인 한 글자는 바로 골(骨)이다. 말하자면 글씨의 뼈이며, 먹의 뼈이다. 그것은 곧 사람의 정신과 기운이 존재의 뼈를 종이 위에 옮긴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묵기(墨氣)가 드디어 하나의 철골(鐵骨)처럼 글씨 안에 들어앉는 순간이다. 서양의 필기구는 이 철골을 그대로 펜촉으로 만들었다. 이를테면 피와 살이 없는, 인정이 없는, 앙상한 뼈의 건축물을 글씨로 삼은 셈이다. 그러나 붓은 이 뼈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면서 천변만화의 글씨를 만든다. 심을 드러낸 노봉(露鋒)은 힘 있고 메마르며, 심을 숨긴 장봉(藏鋒)은 부드러운 심연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뜻은 글씨의 뼈대인 골(骨)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술이라 할 수 없다. 다만 단단한 구조물을 글씨의 내부에 박는 기초 작업이다. 서양의 펜은 기초 작업만으로 실용적인 글씨의 세계를 만들어갔지만, 동양의 붓은 그 뼈대에서 더 나아가 글씨 자체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제 글씨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다. 묵육(墨肉)과 묵혈(墨血)이다. 살과 피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일어난다. 인체와 비교하는 것이라면 살보다는 피가 먼저여야 할 것 같다. 살은 거죽을 이루는 것이고 피는 내부의 순환과 관련된 것이다. 뼈대 위에 피가 돌고 그 위에 살이 얹히는 게 맞는 순서일 것 같다. 그런데 왜 동파는 묵육을 먼저 말했을까. 나는 감히 말한다. 동파의 이 묵육(墨肉)에 대한 통찰이야 말로 동양 최고의 서론(書論)이며 붓의 특질에 바탕한 글씨의 천만 가지 변화를 집어낸 일대 혜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수량의 추획사는 바로 이 묵육을 간파한 것이었다.
서양의 날카롭고 뾰족한 펜끝은 대개 선(線)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붓끝은 선이 아니라 면(面)을 만들어낸다. 글씨가 굵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붓으로 쓴 글씨는 입체적인 몸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육(肉)이다. 우선 만 오라기의 붓털이 가로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붓털을 묶었다면 요즘 페인트 붓처럼 넓적한 형태의 필기구가 되었을 것이다. 만호(萬毫)가 옆으로 늘어선 페인트 붓이라면 글씨가 어떻게 나올까. 만개의 선이 붙어서 하나의 면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서로 겹치는 일 없는 가는 선들이 모여 만드는 면이다.
그러나 붓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털들이 둥근 테두리 속에 묶여 있다. 그것으로 글씨를 쓰면,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생겨난다. 앞의 붓털과 뒤의 붓털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나가면서 선과 면을 두텁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글씨를 쓰는 일은 그 붓 터럭들이 방향을 지니고 움직이며 서로 겹쳐지고 흩어지는 작용들이 만들어내는 표현이다. 즉 붓의 형태는 스스로가 입체이다. 그것이 평면에 씌어질 때는 선과 면이 된다. 글씨는 입체를 평면 위에 담는 기법이다. 저수량의 추획사(송곳으로 모래 긋기)는 이 입체적인 접촉 원리를 터득하기 위한 공부였다. 3차원적인 붓의 입체적 형상이 2차원적인 종이의 평면 위에 내려앉을 때 어떻게 입체가 형상화되는가의 문제. 그것이 동파가 찾아낸 묵육(墨肉)이 아닐까 한다. 글씨는 한 개의 붓 터럭이 지나간 자취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 천 개의 붓 터럭이 서로 겹쳐지나가며 깊이를 이룬 입체미를 지닌다. 이것이 신기골육혈이 담은 핵심 통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묵혈(墨血)은 먹의 피이다. 먹은 결국 평면에 옮겨진다. 피처럼 도포(塗布)된다. 입체에서 평면으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평면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입체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씨가 아니다. 3차원에서 내려와 2차원적 양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들어앉아야 한다. 그것이 묵혈의 정신이다. 원래는 한 정신과 기운의 움직임이었던 것이, 드디어 뼈를 갖추고 살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이나 혹은 행위예술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종이라는 매체에 구속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철저히 인식해야 그것을 초월하는 서예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신기골육혈의 순서에 담긴 함의가 아닐까 한다.
출처 빈섬 블로그 옛날다방에서 http://blog.joins.com/isomkiss
'사람들의 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신도 혹시 북곽선생입니까? (0) | 2023.07.14 |
|---|---|
| 패거리 짓지 말라 (0) | 2023.07.13 |
| 쌍화탕과 나 / 박 대인 (0) | 2023.07.12 |
| 여행, 또 하나의 나를 찾는 길 (0) | 2023.07.12 |
| 참된 여행은 방랑이다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