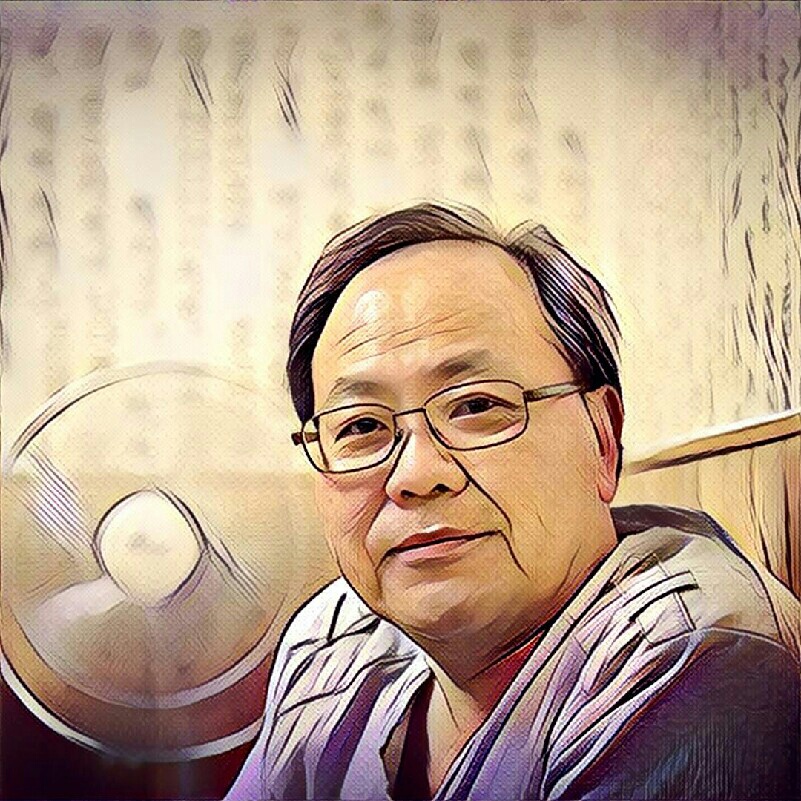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male base vocal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碑巖寺
- 추억의도시
- 익숙해질 때
- 60bpm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blues&jazz
- 티스토리챌린지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황우창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male vocal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1mm 치과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오블완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y.c.s.정모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방아깨비 본문

엄마인가? 아내인가?
사무실로 튀어 들어 온 한 쌍의 방아깨비!
" 저게 뭐야? 한마리가 업혀 있네 !"
제천 양반의 단호한 한 마디..
"연애중이네요! "
이어서..
"수컷을 때때라고 불렀어요"
그 ~~~ 래..?
"당신말이 맞다 해도 비율이 안 맞아.." !
내게는 사실보다 생물학적 설명이 필요할 뿐이다.
방아깨비
어린 시절에 흔히 보았던 곤충 중에서 좀처럼 볼 수 없게 된 것이 많다. 우선 달팽이나 풍뎅이가 그러하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 청소를 하다 보면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가 눈에 띄곤 했다. 또 소방용으로 마련된 조그만 못에서는 방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뒷다리를 잡으면 방아 찧듯이 몸을 놀려 꼬마들이 가지고 놀았던 방아깨비도 흔했다. 이제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기야 종달새나 제비도 보지 못하니 그만 못한 미물이야 말해 무엇 하랴
곤충 중에서 참 이름이 잘 지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고추잠자리다. 일어에서는 그냥 붉은잠자리라 하는데 우리는 고추잠자리라 부르니 얼마나 그럴듯한가! 장수잠자리도 그럴듯하다. 실물이 별 볼 일 없고 흉측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진 이름을 가진 것이 송장메뚜기다.
생긴 것은 메뚜기와 똑같은데 음산한 회갈색이어서 호감이 가지 않았고 그래서 송장메뚜기라 한 것 이리라. 메뚜기를 잡아 볶아 먹던 시절에도 송장메뚜기는 잡아먹지 않았다. 꼬마들이 풀숲을 지나다 송장메뚜기를 보면 재수 없다고 침을 퉤퉤 뱉기도 하였다. 송장개구리, 송장풀, 송장벌레 등 '송장'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이들의 실물은 별로 음산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동식물에 대한 공연한 정신적 학대 사례다. 이용악의 대표작 「오랑캐꽃」은 이러한 편견이란 이름의 억압에 대한 항의이고 따라서 소외를 노래한 시편이다.
- 이용악, 「오랑캐꽃」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띳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흠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쓰레기 버려드릴게, 근데 애는 하나만 낳았수?”… (0) | 2023.09.07 |
|---|---|
| 송도해수욕장에서 으랏차차~ (0) | 2023.09.07 |
| 여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0) | 2023.08.16 |
| 글씨가 짤려서 조금 아쉽군 (0) | 2023.08.09 |
| 1972년 졸업사진 경복궁에서.. (0)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