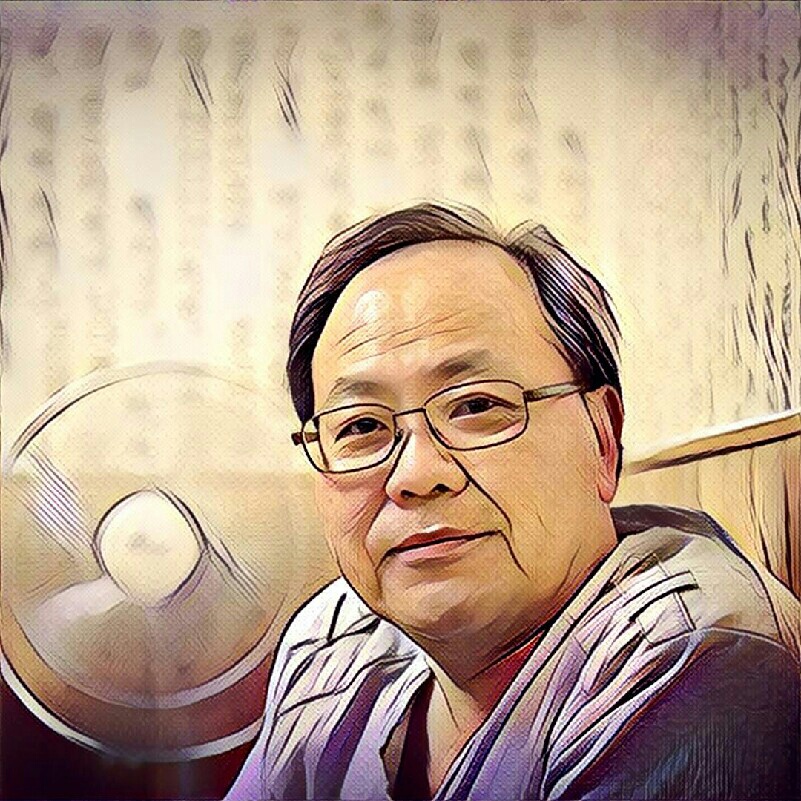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y.c.s.정모
- 오블완
- male base vocal
- 추억의도시
-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진추하
- 티스토리챌린지
- 퓨전재즈의 열풍 #장본인 #색소폰 #케니지
-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 1mm 치과
-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 인천대공원#포레#파반느#단풍
- 인학사무실#참우럭#놀래미#도미#금문고량주#두열#제물포#마장동고깃집#마장동
- 60bpm
- 누가바#상윤네집#진열이#금복
- 양파즙#도리지배즙#배도라지청#의약용파스#완정역#호경형
- 시각장애인 #안드레아 보첼리
- 인천시민과함께하는시화전
- 익숙해질 때
- 감정의 깊이가 다른 말
- 황우창
- 이어령#눈물한방울
- 碑巖寺
- new trot. male vocal. 60bpm. piano. cello. orchestra. lyrical. languid.
- 사르코지 #카콜라 부르니 #불륜 #남성편력
- lost in love "잃어버린 사랑" - 에어서플라이 (air supply)#신포동#ai가사
- 동인천역 가새표#남수#보코#친구들
- 경로석#한국근대문학관#윤아트갤러리
- 석민이#경민이#도화동시절
- 빌보드 #노라 존스 #재즈
- fork. male vocal. 75 bpm.piano. cello. lyrical. lively.
- Today
- Total
형과니의 삶
화려한 삼국의 궁궐 본문
화려한 삼국의 궁궐
한국적 '아고라'의 풍습은 허다한 지방에서 구전되고 있었다. 마라도에서는 그 마을 둔덕에 있는 '평바위'에서 의결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강원도 횡성의 영광대(永郞臺)는 외환(外患)을 당해서 젊은이들이 서천 결의(誓天結義)하는 곳이었다.
또 3·1운동 때 부락민들이 올라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양주 수락산(水落山) 북쪽 두메의 '만세바위'도 마라도의 평바위처럼 효력이 보장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풍습은 대궐 이전의 원시 부족사회의 정사 방식이었음이 분명하다. 신라의 4대 영지나 백제의 정사암은 그러한 풍습이 왕권이 확립된 후에도 강구하게 국가적인 규모로 실천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렵의 궁궐은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국왕의 거소라는 비중이 후세에 비해서 컸던 것이 아닐까? 그 궁궐이 삼국·고려시대에는 평지가 아니라 구릉 위에 건축되었다. 또 남면이치(南面而治)라지만 대궐이 남향한 것은 조선 이후요, 고려시대에는 동향이었다.
그럼 현존하는 대궐의 건물로써 이것을 설명해 보자.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덕수궁의 중화전도 하나같이 남향이다. 즉 조선시대에 지어진 궁궐과 같은 양식이다.
그런데 창경궁의 명정전(明政殿) 하나가 동향으로 조선시대의 상례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창경궁 정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명정전은 ≪육전조례(六典條例)≫ 및 ≪궁궐지(宮闕志)≫에 의하면 고려대의 건축이라고 세칭되고 있었다. 임란의 병화를 기적적으로 면한채 명정전의 일부는 고려대의 건축이 그대로 잔존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특권계급은 중국인도 '호치궁실(好治宮室)'이라고 평할만큼 퍽이나 건축을 좋아했다. 신라는 헌강왕(憲康王) 무렵에는 성중에 초가집이라곤 없었고 밥도 숯으로만 지어 먹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백제에는 개로왕(蓋鹵王)의 비극이 있지 않았던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간첩인 도림(道琳)은 백제에 들어가 살면서 바둑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다. 그리고 궁실과 누각, 사성(蛇城) 같은 커다란 공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국력이 피폐하자 장수왕은 정병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개로왕은 대패하여 달아나다 고구려인에게 피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고려 이전 삼국시대의 궁궐들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음을 설명해 주는 좋은 자료인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학자들은 고구려의 유지(遺址)에서 발견되는 초석(礎石)과 와당(瓦當)으로써 그 시절 건축의 웅장함을 말하고 있다.
또 안압지와 포석정의 호사한 환락! 성곽은 삼국이 각축하던 무렵에 특히 발달했다. 궁궐은 신라통일 후에 급속히 화사해지면서 포석정 곡수(曲水)의 놀이를 빚은 것이다.
그럼 삼국시대의 성곽과 궁궐을 더듬어 보자. 성곽은 크게 산성(山城)과 평성(平城: 일명 枰城), 국경성(國境城)으로 분류된다. 그 중 산성은 도시 부근의 험준한 산 위에 쌓은 것으로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병기,군량,연료 음료수 등을 설비해 둔 채 전시에만 들어가서 적과 싸운다. 그 재료는 다른 두 가지도 대동소이 하지만, 토성(土城)·석성(石城)ㆍ토석잡축(土石雜築)과 더러는 목책(木柵)도 등장한다. 또 형태적으로는 반월성(半月城)·옹성(甕城)·장성(長城)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평지성(平地城)은 도성(都城)이며 읍성(邑城) 등으로 평지에 거주하는 곳이다. 평지성이라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개는 구릉위에 축조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왕궁 혹은 관촌을 포함한 왕성(王城:일명 재성(在城))뿐이었지만, 삼국시대 후기에는 시민 부락까지를 포함해서 나성(羅城), 즉 외성(外城)을 두르게 되었다. 때문에 ≪양서(梁書)≫ 신라전(新羅傳) 에는 그 국속(國俗)이 성을 건모라(建车羅)라 부른다고 했다는데, '큰 모르·큰몰[大村)'을 사음(寫音)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고구려의 평양성, 백제의 사비성 (泗沘城), 신라의 금성(金城)이 하나같이 나성안에 시민부락과 왕성이 있는, 즉 큰 마을이자 이중(二重)의 성이었다.
고려는 태조가 만월대(滿月臺)를 쌓을 때 둘레 2천 6백 간의 황성(皇城), 즉 대궐담은 있었다. 그러나 성 밖의 시민부락과 관아를 포함한 나성은 없었다. 현종 (顯宗) 초기에 나성을 축조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외환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후 강감찬이 주청하여 현종 20년에 완공된 개경 (開京)의 나성은 둘레 2만9천7백 보, 높이 27척에 두께 12척이다. 대문 4. 중문 8. 소문이 13. 연인원 30 여만이 동원됐는데, 그 안에 5부(部) 35방(坊) 343동 (洞)으로 갈라진 시민부락이 있었다.
/ 한국사회풍속야사 - 임종국
'철학,배움,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간 이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0) | 2025.02.03 |
|---|---|
| 묵매(墨梅) (0) | 2025.02.02 |
| 조선 시대의 대중언론 (0) | 2025.02.02 |
| 덕이 있는 사람 (0) | 2024.11.04 |
| 왜색 지명 (1) | 2024.10.20 |